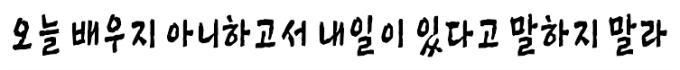기행문 산티아고 순례길 낙수 ( 제 5 신 ) -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페이지 정보
작성자 Angel 댓글 0건 조회 1,211회 작성일 14-10-06 03:56
본문
피로가 덜 풀린 무거운 몸으로 아직도 어두운 내리막 길을 나선다. 머리에 두른 랜턴 불빛과 두 스틱에 의지하고가파른 경사지를 모로 내려가는데, 아래에서는 미끄러지며 나오는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린다.
산행에 익숙한 내 발걸음이 여럿을 추월하다 회초리같은 나뭇가지를 짚고 벌벌 떨며 내려가는 어제의 두 여성을 만났지. 대만여인 에게는 내 스틱 한짝을 빌려주고 보다 젊은 한국여성에게는 튼실한 막대기를 줏어주려 길가 숲으로 들어가니 이상한 모양의 바위들이 눈에 띈다. 돌출된 바위들 중간부분이 땅콩 껍질처럼 잘룩하다. 세월따라 바위꽃들이 덮였지만 10 여개가 모양새가 같다.
좀 더 내려오자 갈색 간판에 ‘나폴레옹’ 군대가 스페인 정복때 이 고개를 내려가면서 아래쪽으로 쏠리는 대포와 짐마차를 로프에 걸어 버팀바위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그 병사들과 말들의 극심한 고생이 눈에 선하다. 바위가 저토록 잘룩하게 파이다니!
호기심에 언제부터 누가 이 루트를 개척했나 찾아보니, 기원전 90만년경 더 낳은 삶의 조건을 찾아 헤메던 ‘HomoAntecessor’ - 지능을 가진 원시인들 - 의 고증된 흔적이 있으며, 그후 기원전 1 만년경 부터는 사냥과 채집을 한 동굴벽화들이 여러 군데 있고, 기원전 4천년경 부터는 고대인의 예배당역인 고인돌등 거석문화가 산재되어 있고, 언제부터 아일랜드민족의 주류인 ‘켈트’족이 여기 피레네 고원지대를 거쳐서 바다를 건넜다 하네.
어쩐지 민속그림에 아일랜드 풍의 무늬있는 스커트에 베레모와 파이프를 부는 모습이 자주 보이고, 농가의 돌담위에 날카로운 삼각 돌들을 얹은 모습이 오늘날 아일랜드 농촌의 모습과 흡사하더라. ‘이베리아’ 반도 중부아래로는 ‘사하라’ 사막의 기후대에 속하여, 뜨거운 낮에는 ‘시에스타’라는 풍습으로 한낮의 폭서를 피한다.
여기 고원에는 이렇게 기후가 좋아 오랜 세월에 걸쳐 지적유산이 농축되고 감성적 개발이 일찍 이루어졌고 풍부한 광물자원과 채광 및 연금기술에 이끌리어 기원전 200년경에 로마제국의 세력이 진출하였고, 그 후 ‘한니발’ 장군의 군대 또한 이곳을 거치면서 미술 조각 건축기술과 물산의 생산력이 높은 수준으로 이어온 고원으로, 그 폭이 우리의 경상남북도를 합한 폭이고, 길이는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을 이루며 서쪽으로 달리다 불란서와의국경이 끝난 곳부터는 바다에 면한 북부지역을 형성한다.
오늘은 삼일째, 해발 600m 정도 되는 경관이 아주 수려한 ‘바스크’ 지방의 목가적 풍광이 이어진다. 아니 ‘목가적’이란 말이 여기서 시작된것 아닐까?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이다.
언젠가 가족들 동반하여 다시 찾겠다는 맘을 먹었지. 굽이치는 강의 모습도 너무 고와 표현할 나의 형용사가 부족하네. 경치에 취해 보폭도 작아지고 걷는 속도 또한 떨어지니 흐르는 강물의 유속이 너무 빠르다. 아하..! 내가 분주히 움직일 때는 강물이 느리게 느껴지더니만, 내가 더디니 저 강의 유속이 빨라지는구나. 시간의 흐름도 내가 조절할 수가 있겠구나. 많은 일을 만들고 또 기다림을 만들자, 그러면 내 인생 시계는 천천히 가겠구만.. !
초등학교시절 3주전에 예고된 소풍날이 그토록 느리게 다가오던 기억과 다음 반공일 자전거 사준다는 약속이 잠을 설치며 어찌나 더디게 닥치던지.. .
이 길 걷는 fellow pilgrims! 모두 자기성찰의 기회를 갖고자 떠나왔을 터인데, 저토록 아름다운 풍광을 스치지 말고, 또 위치좋은 침대 먼저 차지하려 서둘지 말고, 저들 풀 뜯는 소처럼 여유로움을 가져 보시구려!
중세부터 순례자를 위하여 강가 숲 그늘에 만들어 준 돌을 깍아 만든 몇 개의 식탁에서는 모처럼 활기찬 점심 파티가 열렸다. 서로가 배낭을 풀고 먹거리와 과일 등을 내놓고 권하며 피곤을 떨구는 모습에서 훈훈한 인간애를 물씬 접하는 시간을 가졌지. 한편에서는 탈이 난 발바닥을 살펴주고 약을 발라주는 헌신적 모습 또한 잊지 못할 장면 이었다. 나도 양쪽 발바닥 여러 군데에 물집이 생겨 아리고 걷기가 불편하여 난감하네. 이 고생스런 하루, 그래도 일상에서 자주 접하지 못하는 정신적 만족이 풍성하여 육체적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 드는 구만. 비익조 와 연리지처럼 살아낸 하루라는 느낌이 들었지.
하도 몸이 고달프니까 오히려 잠이 쉬 오지를 않네. 가지고 온 시집을 펴 도종환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 읊어본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을 따뜻하게 피웠나니 /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몇 번을 되 읽어도 몸만 착가라앉을뿐 오히려 머리는 더 맑아지고 잠이 쉽게 오지않네. 쓰라린 발바닥을 내려다 보니 내일 걸어 갈 걱정이 태산같이 느껴져 이 시름 저 시름과 씨름하다 잠에 깊게 빠져 들었다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