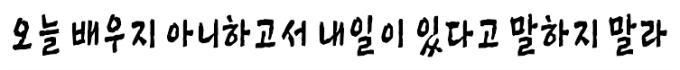수필 Subway 입구에서 울고선 형제 꼬마들: 정 요 셉
페이지 정보
작성자 yale 댓글 0건 조회 3,272회 작성일 11-03-03 13:34
본문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데, 막상 시원한 직업이 없는 우리들에게는 산다는 게 절박한 문제였으나 조금도 걱정이
안 되는 게 또한 문제였다.
아직 혈기 방장한 삼사 십 초반, 두려움은 없었다. 용기를 갖고 애들 엄마는 맨하탄 봉재 공장에 괄시를 받으면서도 기초
과정을 거쳐 열심히 어려움을 견디며 일하게 되었다.
그도 그렇지, 어디 쉬운 일이 있으랴! 서투른 솜씨라 미싱 바늘이 손톱을 관통하는 일이 한두 번이랴.
사십 년 이 가까워 오는 지금에도 그 흔적이 남았으니 말이다.
한국에서야 다 그랬듯이 살림만 살던 그가, 막상 살아야 하니, 내가 뭐 공장 띠기 하러 미국까지 온 건가 하는 후회는 사치
스런 넋두리에 불가한 오늘, 배워 온 것도 아닌 직업, 하기야 예외 되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 인간은 이상한 키 같아서 어느 환경에도 들어 맞기 마련인가 보다.
이는 결코 인간 스스로가 아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잖은가! 물론 거기엔 눈물의 기름이 쳐져야 하지만……….
우리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침에 두 내외가 집을 나서면, 다섯 살, 여섯 살 백이 꼬마 둘만 집에 두고 나가는 것이었다. 물론 위법이었으나, 그 때만 해도 어린이 집 도’ 보호소도어두운 때라 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모르면 용감한 법. 법을 알았으면
감히 그렇게 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꼬마들에게 문 잠그는 법을 가르쳐 주고, 어디 나가고 싶을 때는 나가데, 절대로 멀리 가지 말라고 타 이르고 출근 하는
것이다. 그 당시 Green Point 일대에는 폴랜드인 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한국사람들의 탁아소는 없었다.
그러니, 자연 애들을 두고 나갈 수 밖에 없지 않는가!
제 엄마가 타고 가는 Green Point Substation 입구까지 살살 따라 나왔다가, 엄마가 가라고 손짓하면 아파트로 돌아가.
둘이서 제 아빠가 거리에서 주워다 놓은(그 당시에는 사용 가능한 TV들이 길가에
종종 나와 있었다. 스타일이 변경 될 때 신형을 선호하기 때문이리라) TV를 보며 제 올때까지 종일 제 엄마가 올때쯤 까지
둘이서 먹는 것도 해결하며 기다리는 것이었다.
1977년경이라. 토요일이면 가구들이 길가에 많이 나오는데, 필요하던 차에 RCA TV가 쓸만한 하기에
, 새 것을 구입할 때까지 볼 셈치고 들여 놓은 것이 그들의 유일한 장난감이었다.
그래서 두째 놈이 어느 날,
“아빠! 뉴욕 와서 거지 됐어” 하고 탁자를 주워온 나에게 놀리기도 했다.
매일 오후 제 엄마가 올 시간이면 Subway 입구에서 그 난간을 붇잡고 장난하며 기다리다가,
제 엄마가 여러 사람들 틈에서 나오기만 하면, 마치 주인 기다리던 강아지들이 주인을 꼬리치며 어쩔줄 몰라 반가워 하듯, 엄마 치마 자락을 양쪽에서 잡고 매달리다시피 하여 집으로 오곤 하는 것이었다.
그날도 제 엄마는 정한 시간에 Subway 문을 나왔는데, 애들이 보이지 않자, 간이 콩알만 해져 어찌된 일인가 싶어, 등골에 식은땀이 짜르르 흐르는 느낌을 억누르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거기서 조금 떨어진 벽 옆에 서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너무 반갑고 안심이 되어 재빨리 다가가니, 그냥 두 놈이 다 엉엉 울더란 다.
그들의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이 진 채……….
한참 우는 애들을 껴안은 엄마도, 덩달아 꼭 껴안고 눈물을 쏟다가 “누가 때렸어? “
“우리가 노는데, 동네 애들이 때리지 뭐야. 시팔….”
서럽고 분이나 제 분에 또 훌쩍 훌쩍 울먹거린다.
“사내 놈들이 울긴! 뚝 그쳐, 내가 그 놈들 혼내 줄게, 염려 마. 그리고 너 들 조금만 더 커서, 태권도로 그 놈들 실컷 두들겨 줘 알았지, 오케이. 오늘 엄마가 만난 것 많이 사 왔어. 이젠 집에 가는 거야! ” “ 됐지!!…”
그제야 의기 양양해 쫄랑 쫄랑 집으로 따라 왔단다. 큰 놈은 원래 뚝심이 있고, 지기를 싫어 하는 성질인데도, 제 보다 큰 놈들이 ‘챠이니스’라 놀려 대며 때려 주니 맞을 수밖에……….
그 얘기를 듣는 제 엄마는 속으로 통곡을 하며 “오냐 두고 봐라, 네놈들 보다 얘들이 더 잘 되게 키울 테니까, 네 놈들이
그들의 밑에서 굽실거릴 때가 오리라, 다짐을 했단다.
그날 저녁 그 얘기를 듣고, 애들을 꼭 안아주며, “내일부터 태권도 배우러 가는 거 다. 알았지.”
“어디 있는 데…”
“우리 동네에서 조금만 걸어 가면 있어……”
그들은 도복 조차 몇 번 빼앗기면서도 튼튼히 자라, 두 놈 다 ‘ S V 고등학교를 둘 다 나와 대학을 거쳐’ 떳떳이 살아 가고
있다.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