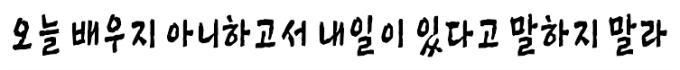기행문 산티아고 순례길 낙수 ( 제 13 신 ) - 나만 속세적 마음에서 허우적 거렸구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Angel 댓글 0건 조회 1,495회 작성일 14-10-06 10:41
본문
저 앞서 걷는 두 남자의 모습이 점점 닥아온다. 한 사람의 발이 몹시 불편해 보이는구나. 옆에 다다르며 도울 일 있느냐 묻자 연고와 붕대를 찾는다. 꽃나무밑 그늘에 앉아 양말 벗은 모습을 보니 딱하다. 알콜솜, 항생제 가루, 연고, 붕대를 제공하여 추스려주고서야 통성명을 하니 36세의 헝가리인이다.
또 한 이는 동년배의 스페인남자. 한창 일 할 나이라 생각되어 무슨 동기로 시작했냐고 물으니, 스페인은 자동차 딜러였는데 실직을, 헝가리는 측량기사로 아랍국가에 고용되었다 계약이 끝나 가보고 싶던 이 길을 왔단다. 그런데 두사람 사이에 대화가 전혀없어 무슨 언어로 소통을 했는가 물으니 두 사람 서로 보며 웃기만 한다. 눈으로 대화하며 며칠을 함께 온 것이다.
스페인은 전혀 먹통이고, 그래도 헝가리는 영국식 영어를 약간 하더군. 하는 수 없이 대화를 중재하며 함께 걸었지. 내리막 길과 강을 건너고 숲을 통과하니 다시 언덕길이 시작된다. 이들과 보조를 같이 했다가는 해질녘까지 내 목적지에 다달을 것 같지 않아 섭섭한 마음을 누르고 앞서 가겠다고 악수를 나누는데 헝가리의 눈이 젖어드는 내색이다. 말 없이 가는 고행길이 얼마나 답답하였을까..? 젊은이들아 힘내라, 나도 30대에 일을 가장 많이 했다 격려하고 앞질러 나갔지.
오후 4시가 조금 지난 시간인데 깊은 계곡 길이라선지 땅거미의 빛이다. 오르막길을 어설프게 아니 민망스레 발을 벌리고 걷는 여인이 보인다. 작은 키에 배낭은 왜 그리 길고 통통한지 발만 보인다. 백여미터 앞에는 일행인 여자 둘이 뒤를 돌아보며 서있다. 말없이 스틱자루로 배낭 밑을 치켜주며 쫓으니 고개도 돌리지않고 “ Thanks ! ” 한다. 직감으로 영어권에서 왔으리라 생각하고 어디가 많이 불편한가 물으니 사타구니에 가래토시가 생겼단다. 양쪽에 야구공 반만한 크기 라네!
너무도 딱하여 배낭을 대신 메어주고 싶더라. 자기 소개말에 미국 Florida주 Everglades National Park 의 Ranger 이며 평소 운동을 즐기는 편이라 자신감을 가졌는데 엊그제 넘은 그 높고 미끄럽던 고개가 결정적인 장애인것 같다하네. 뉴욕의 의사로 은퇴한 선배부인이 탈없이 끝내라며 싸준 마취제가 들어있는 석장뿐인 파스를 꺼내 두장을 건네주고, 빨리 회복하라는 말과 눈길을 주고는 앞서 서둘러 갔지. ( 대 엿새후 순례자식당에서 저녁을 기다리는데 노랑머리의 여인이 내 미국이름 “ Ken ! ” 을 외치며 달려와 목을 감싸며 입술이 볼에 닿는다 싶더니 정작 입술에다 포개는데, 준비된 마음과 분위기없이 얼떨떨하게 Kiss 를 받고서야 뒤늦게 허리감은 손에 힘을 주었구만 )
내게 받은 파스를 붙이고서 자고나니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 후 이틀은 반나절만 걸으니 거뜬해졌다네. 자기감정을 숨기지 않는 서양여인의 한 단면을 경험했다오.
인사를 끝내고 각자 자기 테이블로 가 앉으니, 이번에는 왼쪽자리에 있던 프랑스부인이 웃으며 냅킨으로 내 볼과입술의 루즈를 닦아주는구만, 남편은 빙그레 웃고. 그 옆의 프랑스인은 소리없는 박수도 처 줍디다. 남자 셋에 여자 한명, 이상한 동반자라 생각이 들어 조심스레 물으니 세 쌍이 떠나긴 하였는데 두 부인은 걷는 것을 싫어해 승용차 두 대에 짐들을 싣고 2, 3일 걸릴 길을 미리가서 관광하고 기다린다네. 여기 세 남편과 한 부인은 며칠만 입을 옷가지를 챙겨 떠나니 내게 비하면 신선놀음이다.
저녁 후 샤워를 끝내고 다음날 떠날 짐을 챙기는데 옆 침대에 오르는 여인의 흰 발의 선과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눈의 초점이 흩어진다. 날씨가 풀리니 여성들이 실내에서 hot pants 를 즐겨 입는다. 너무들 하는구나. 이길 여기 오기까지 매일 매일 고달프기도 하고, 이성에 이끌리는 시선은 불경스럽고 타락한 마음의 표출이라고 다독여왔는데, 남자들 시선은 헤아리지 않고 선정적으로 노출하면 어떻게하나. 자꾸만 옆 침대의 하얀 다리에 눈길이 간다. 아무래도 잠이 쉽게 오지 않을 것 같아, 저녁 먹은 식당의 테라스에 앉아 큰 맥주잔을 기울이며 주변을 바라보니 아 거기, 대각선 건너편의 시청일까 도서관일까 싶은 품위있는 건물 지붕을 받치고 있는 네 개의 멋진 대리석 기둥! 또 다시 그녀의 미끈한 두 다리가 눈에 아른거리네.
두 잔째 기울이다 여류시인 문정희씨의 『 치마 』가 불현듯 떠오르더군. 취기때문인지 싯귀가 안잡혀 애를쓰다 사방이 칠흑속에 묻히며 숙소로 발걸음을 돌렸지.
취한 모습으로 알베르게에 들어서니, 무겁고 조용하고 어둑한 분위기에서 곤하게들 잠들고 있다. 나만 속세적 마음에서 허우적 거렸구나. 옆의 침대도 몸을 덮은 채로 깊게 잠든 것 같다.
조심스레 자리에 누워 잠을 청하는데, 우리의 솟쩍새가 참으로 구성지게 울어댄다. 정말 저러다 피멍들지.. . 이제 그만 울어다오, 내 마음 또 흐뜨러질라. 그 우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 이전글산티아고 순례길 낙수 ( 제 14 신 ) - 고행길이 주는 의미는 자기위안과 성취감 14.10.06
- 다음글산티아고 순례길 낙수 ( 제 12 신 ) - 나의 명상과 성찰을 위한 시간, 관광이 아니지 14.10.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