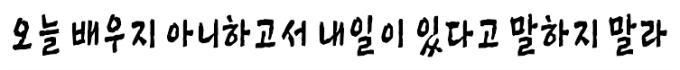수필 "우리 서로 좀 치켜주며 살아요…네?" 김승희 시인·소설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4,494회 작성일 11-03-05 08:28
본문
‘두부찌개’를 아주 잘 끓이는 여자가 있었다. 그녀의 ‘두부찌개’는 울긋불긋하기도 하고 푸릇푸릇하기도 하여 보기에도 좋고 맛도 있었다. 남편이 회사 내 조직 생활을 견디지 못하여 실직하자, 아이들과 함께 먹고살려고 그녀가 동네에 ‘두부찌개’ 가게를 열었다. 그녀의 두부찌개가 맛있다는 소문이 번져 그녀는 돈도 좀 벌게 되었고 남편과 함께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하여 생활도 안정을 찾게 되었다. 언젠가 그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자기 집 두부찌개가 맛있는 비결을 묻자 “두부찌개를 끓일 때 탕기 속에서 온갖 재료와 고추장과 두부가 합쳐져 얼큰히 끓으면서 ‘얼씨구’ 소리를 내면 그 찌개는 성공적으로 끓여진 것”이라는 요지의 말을 했던 것 같다. “아무리 손님이 밀려도 찌개 냄비 안에서 ‘얼씨구’ 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은 절대로 손님상에 올리지 않는다”고. 요리하는 아줌마의 단순한 말이라고 지나쳐 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엄연한 철학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여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다.
그때의 ‘얼씨구’란 감탄사는 ‘흥겹게 떠들며 놀 때, 가볍게 장단에 맞추어 내는 신명의 소리’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다. 찌개 하나를 끓여도 ‘얼씨구’ 신명의 소리가 절로 날 때까지 정성을 다 하여 끓여 내는 것, 그 말은 나를 많이 부끄럽게 하였다. 그때 나는 어린 자식들을 키우느라 비틀거렸고 학위 논문을 쓰랴 또 시를 쓰랴 여러 가지로 생활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는데 그 어느 하나에서도 ‘얼씨구’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좀 힘들었다. 총체적 부실의 허영 덩어리가 바로 나라는 존재 같았다.
같이 공부하던 선후배들은 여성 학자를 인정하지 않는 취업전선의 분위기에 실망하여 뉴질랜드로, 캐나다로 이민들을 떠났다. 뉴질랜드에서, 캐나다에서 가정주부로 잘 살면서도 자기에게 한 번도 ‘얼씨구’ 신명의 추임새를 곁들여 주지 않던 한국 사회의 냉담을 원망하였다. 그러면서도 저녁이면 꼭 현지 국제 채널에서 나오는 한국어 방송과 드라마를 보면서 아이들에게도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노력하며 그 나라의 아름다운 천연 자원을 즐기며 잘 살고 있다. 그 중 한 선배가 얼마 전 잠시 서울에 다니러 와서 오랜만에 그때 그 사람들이 좀 둘러앉았다. 그런데 기억력이 워낙 비상한 그 선배가 뜻하지 않게도 그 두부 찌개 아줌마의 말을 인용하면서 나에게 말했다.
“내가 물 설고 말 설은 그 외지에서 한국 식당을 하면서 그래도 돈도 좀 벌고 자식들도 좀 성공시킬 수 있었던 힘이 뭔지 아니? 네가 언젠가 말했던 그 두부찌개 아줌마의 그 말 말이야. ‘얼씨구’ 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무슨 일을 하면 된다는 것. 그러면 확실하다는 것. 그 말이 이상하게 잊혀지지 않더라. 그때의 ‘얼씨구’ 소리는 ‘잘 되었다’라는 신명의 소리잖아, 그렇지? 그런 철학으로 내가 그렇게 살았어. 그런 신명의 추임새가 들려 올 때까지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하면서 가게 청소를 해도 요리를 해도 열심히 하니까 주변의 추임새는 물론이고 좀 과장하면 신의 추임새도 들려오는 것 같더라. 잘 한다…라고. 그 아줌마가 왜 그렇게 말했다면서? ‘얼씨구’ 한 마디면 인생은 된 거여…라고….”
인간이란 그렇게 신명을 먹고사는 동물이다. 또 인정(認定)을 먹고사는 동물이다. 무슨 일을 해도 남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일을 할 때 신명의 추임새 소리가 자기 주변에서 들려오기를 바란다. 선배는 오랜만에 귀국하여 서울에 보름 정도 체류했는데 벌써부터 기가 질려 버렸다고 말한다.
“우리 주위를 좀 둘러봐라. ‘얼씨구’ 소리가 들리긴 들려. 아니 넘쳐나고 있어. 그런데 그 두부찌개 아줌마의 ‘얼씨구’ 소리가 아니라, ‘얼씨구 꼴 좋다’라고 할 때의 살벌한 조롱과 빈정댐의 ‘얼씨구’ 소리야. 그렇지 않니? 누가 무슨 일을 해도 ‘얼씨구, 그래 잘들 논다’, 그런 냉소의 목소리. ‘얼씨구’라는 말의 제 2의 사전적 의미. 즉 ‘눈꼴사나운 언동을 듣거나 보거나 할 때 조롱하여 하는 소리’라는 그 ‘얼씨구’ 말이야. 이런 냉소적이고 조롱하는 분위기 속에서 과연 한 개인이 자기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걸까? 오랜 시간 고독을 지키면서 자기 숙성을 거쳐가며 생산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을까? 좀 서로 격려하고 추임새를 넣어주면 더 잘할 수 있는 것 아니야?”
그 선배의 말을 듣고 나도 가슴이 뜨끔했다. 오랫동안 그 두부찌개 아줌마의 그 말을 생각해 보지 않고 닥치는 대로 막 살고 막 쓰고 막 말하고 그래왔던 것 같다. 욕심을 버리고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얼씨구’ 한 마디면 인생은 된 거여…”라고. 그 신명과 격려의 한 마디를 마음으로 듣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생은 계속된다.
그때의 ‘얼씨구’란 감탄사는 ‘흥겹게 떠들며 놀 때, 가볍게 장단에 맞추어 내는 신명의 소리’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다. 찌개 하나를 끓여도 ‘얼씨구’ 신명의 소리가 절로 날 때까지 정성을 다 하여 끓여 내는 것, 그 말은 나를 많이 부끄럽게 하였다. 그때 나는 어린 자식들을 키우느라 비틀거렸고 학위 논문을 쓰랴 또 시를 쓰랴 여러 가지로 생활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는데 그 어느 하나에서도 ‘얼씨구’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좀 힘들었다. 총체적 부실의 허영 덩어리가 바로 나라는 존재 같았다.
같이 공부하던 선후배들은 여성 학자를 인정하지 않는 취업전선의 분위기에 실망하여 뉴질랜드로, 캐나다로 이민들을 떠났다. 뉴질랜드에서, 캐나다에서 가정주부로 잘 살면서도 자기에게 한 번도 ‘얼씨구’ 신명의 추임새를 곁들여 주지 않던 한국 사회의 냉담을 원망하였다. 그러면서도 저녁이면 꼭 현지 국제 채널에서 나오는 한국어 방송과 드라마를 보면서 아이들에게도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노력하며 그 나라의 아름다운 천연 자원을 즐기며 잘 살고 있다. 그 중 한 선배가 얼마 전 잠시 서울에 다니러 와서 오랜만에 그때 그 사람들이 좀 둘러앉았다. 그런데 기억력이 워낙 비상한 그 선배가 뜻하지 않게도 그 두부 찌개 아줌마의 말을 인용하면서 나에게 말했다.
“내가 물 설고 말 설은 그 외지에서 한국 식당을 하면서 그래도 돈도 좀 벌고 자식들도 좀 성공시킬 수 있었던 힘이 뭔지 아니? 네가 언젠가 말했던 그 두부찌개 아줌마의 그 말 말이야. ‘얼씨구’ 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무슨 일을 하면 된다는 것. 그러면 확실하다는 것. 그 말이 이상하게 잊혀지지 않더라. 그때의 ‘얼씨구’ 소리는 ‘잘 되었다’라는 신명의 소리잖아, 그렇지? 그런 철학으로 내가 그렇게 살았어. 그런 신명의 추임새가 들려 올 때까지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하면서 가게 청소를 해도 요리를 해도 열심히 하니까 주변의 추임새는 물론이고 좀 과장하면 신의 추임새도 들려오는 것 같더라. 잘 한다…라고. 그 아줌마가 왜 그렇게 말했다면서? ‘얼씨구’ 한 마디면 인생은 된 거여…라고….”
인간이란 그렇게 신명을 먹고사는 동물이다. 또 인정(認定)을 먹고사는 동물이다. 무슨 일을 해도 남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일을 할 때 신명의 추임새 소리가 자기 주변에서 들려오기를 바란다. 선배는 오랜만에 귀국하여 서울에 보름 정도 체류했는데 벌써부터 기가 질려 버렸다고 말한다.
“우리 주위를 좀 둘러봐라. ‘얼씨구’ 소리가 들리긴 들려. 아니 넘쳐나고 있어. 그런데 그 두부찌개 아줌마의 ‘얼씨구’ 소리가 아니라, ‘얼씨구 꼴 좋다’라고 할 때의 살벌한 조롱과 빈정댐의 ‘얼씨구’ 소리야. 그렇지 않니? 누가 무슨 일을 해도 ‘얼씨구, 그래 잘들 논다’, 그런 냉소의 목소리. ‘얼씨구’라는 말의 제 2의 사전적 의미. 즉 ‘눈꼴사나운 언동을 듣거나 보거나 할 때 조롱하여 하는 소리’라는 그 ‘얼씨구’ 말이야. 이런 냉소적이고 조롱하는 분위기 속에서 과연 한 개인이 자기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걸까? 오랜 시간 고독을 지키면서 자기 숙성을 거쳐가며 생산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을까? 좀 서로 격려하고 추임새를 넣어주면 더 잘할 수 있는 것 아니야?”
그 선배의 말을 듣고 나도 가슴이 뜨끔했다. 오랫동안 그 두부찌개 아줌마의 그 말을 생각해 보지 않고 닥치는 대로 막 살고 막 쓰고 막 말하고 그래왔던 것 같다. 욕심을 버리고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얼씨구’ 한 마디면 인생은 된 거여…”라고. 그 신명과 격려의 한 마디를 마음으로 듣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생은 계속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