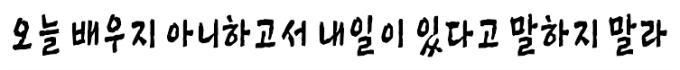소설 [소설]생오지 뜸부기(최종회) – 문순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2,809회 작성일 10-04-01 18:01
본문
전편에 이어..
다음날, 오영기 노모가 휘청거리며 집 밖으로 모습을 나타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목을 세워 천천히 마을을 한 바퀴를 둘러보았다. 마을 안 고샅에서 느티나무와 정자가 있는 동구 밖까지 나왔다가, 정수탱크가 있는 언덕배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평생을 살아왔던 마을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돌아보는 노인은 하고 싶은 말을 꾹 참고, 겉으로 소회를 내비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많은 이야기를 주어 담은 듯 했다.
그런 노인은 시든 들꽃처럼 쇠잔하고 쓸쓸해보였다. 이 마을에 시집 온 후, 70년을 날마다 지겹도록 보아온 산이며 들, 개울이며 돌담과 정자, 크고 작은 나무를 하나하나를 가슴에 담아가려는 듯 이날따라 눈이 무척 깊어 보였다. 되도록 아쉽거나 슬픈 기색을 감추고 마을 사람들과 만나 흔연스레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다소 기력이 쇠하기는 했어도 정신은 전보다 오히려 총총해 보였다.
“우리 영감이, 더 고집 부리지 말고 아들 따라가서 쬐금만 기다리면 곧 나를 데리러 오겄다고 허드랑께.”
노인은 그러면서 웃는 얼굴로 만나는 사람들과 일일이 작별인사까지 했다. 노인은 우리 집에도 왔다. 자책감에 짓눌려 있었던 나는 원기를 되찾은 노인을 보자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아내가 냉장고에서 수박을 꺼내 대접하자 목이 말랐는지 정신없이 먹었다.
“선상님, 뜸부기 꼭 찾으씨요잉.”
노인이 손등으로 수박물이 묻은 입 주위를 쓰윽 훔치며 웃는 얼굴로 말했다. 가까이서 마주보니 노인의 눈이 살아온 연륜 만큼 맑고 깊다. 그 눈으로 내가 진정으로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꿰뚫어보는 것 같았다.
“글쎄요, 아마 못 찾을지도 모릅니다. 뜸부기 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은 있는데 보았다는 사람은 아직 없으니까요.”
“그래도 직심으로 찾다보면 꼭 보게 될 것이요.”
“글쎄요.”
나는 자신 없게 나지막이 말하며 직심(直心)이라는 말을 곱씹어 본다. 참으로 오랜만에 듣는 말이 아닌가. 직심이라는 말은 정직하다는 의미인데, 노인은 왜 내게 ‘열심히’ 라는 말 대신에 ‘직심’이라는 말을 썼을까, 머릿속이 혼란스럽다.
오영기는 새벽에 마을을 떠났다. 아무도 모르게 도망치듯 고향을 떠나버린 것이다. 초저녁에 이삿짐을 모두 차에 실어놓고 마을 사람들이 깊이 잠든 시각에 소리도 없이 떠나버린 것 같다.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보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을 때는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살림살이가 빠져나가고 사람의 체취가 사라져버린 빈 집은 살풍경할 정도로 을씨년스럽고 호젓했다. 마을 뒷산에서 기다랗게 누워 썩어가고 있는 죽은 소나무를 보았을 때처럼 마음이 쓰렁쓰렁했다.
빈집이 마을 사람들을 슬프게 했다.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실로 엄청났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차이만큼 멀고도 아련했다. 아련함은 곧 그리움이 되었다. 오영기와 그의 늙은 어머니, 멍질라와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부스럭거렸다. 이날따라 한껏 푸르러 보인 소나무 뒤로, 한번도 본 적이 없는 멍질라 친정어머니가 햇살처럼 웃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아내의 말대로 소나무는 땅을 박차고 비상을 서두르기라도 한 듯 두 날개를 쫙 편 학처럼 보였다. 두 개의 푸른 가지를 옆으로 뻗고 그 중심에서 하늘을 향해 뻗어 오른 튼실한 우듬지가 학의 목처럼 길었다.
“고향 떠나는 것이 죄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닌듸, 시상에 이러코롬 얼굴도 안 보이고 살째기 가부렀다냐? ”
“잘못한 것은 아녀도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제.”
나는 등 뒤에서 마을 사람들이 수런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도망치듯 몰래 마을을 떠나버린 오영기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떠나는 뒷모습을 보이기 싫은 오영기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아침을 먹으려는데 전화벨이 울려 받아보았더니 또 운곡리 최 노인이다. 지금 그의 논에서 뜸부기 여러 마리가 노닐고 있다는 것이다.
“뜸부기는 무슨 뜸부기가 있다는 겁니까? 당신 치매요? ”
나는 순간 짜증이 폭발해 전화를 끊어버리려다가 버럭 소리를 내질렀다.
“내 말을 고로코롬 믿지 않은 것을 보니께, 뜸부기 찾는다는 거 순전히 사기 아니여? ”
최 노인의 찌렁찌렁한 목소리가 쇠꼬챙이처럼 날아와 내 심장을 마구 찔러대는 것 같았다. 순간 가슴이 뻐개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나는 아침도 먹지 않고 곧장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섰다. 누릇누릇 벼가 익어가는 논다랑이를 눈 아래 두고 서둘러 골짜기를 빠져나가는데, 편백나무 숲이 우거진 산자락 밑 습 초지 쪽에서 뜸-뜸-뜸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급히 자전거를 세우고 귀를 기울여보았다. 분명 뜸부기 소리였다. 부리나케 개울을 건너 몸을 낮게 숨기고 습 초지 쪽으로 다가갔다. 뜸부기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그러나 아무리 주위를 샅샅이 찾아보아도 뜸부기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소리에 홀린 듯 넋을 잃고 습 초지로 뛰어 들어갔다. 뜸부기는 끝내 보이지 않았다. 소리 나는 곳에 돌멩이를 던져보았다. 그래도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숲 초지의 부들과 갈대 속에 몸을 낮추고 다시 귀를 기울여보았다. 뜸-뜸-뜸. 소리는 땅이 아닌 허공에서 들려왔다. 그것은 이승과 저승의 중간쯤에서 들려오는 영혼의 소리처럼 내 가슴에 메아리쳤다.
- 끝 -
다음날, 오영기 노모가 휘청거리며 집 밖으로 모습을 나타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목을 세워 천천히 마을을 한 바퀴를 둘러보았다. 마을 안 고샅에서 느티나무와 정자가 있는 동구 밖까지 나왔다가, 정수탱크가 있는 언덕배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평생을 살아왔던 마을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돌아보는 노인은 하고 싶은 말을 꾹 참고, 겉으로 소회를 내비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많은 이야기를 주어 담은 듯 했다.
그런 노인은 시든 들꽃처럼 쇠잔하고 쓸쓸해보였다. 이 마을에 시집 온 후, 70년을 날마다 지겹도록 보아온 산이며 들, 개울이며 돌담과 정자, 크고 작은 나무를 하나하나를 가슴에 담아가려는 듯 이날따라 눈이 무척 깊어 보였다. 되도록 아쉽거나 슬픈 기색을 감추고 마을 사람들과 만나 흔연스레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다소 기력이 쇠하기는 했어도 정신은 전보다 오히려 총총해 보였다.
“우리 영감이, 더 고집 부리지 말고 아들 따라가서 쬐금만 기다리면 곧 나를 데리러 오겄다고 허드랑께.”
노인은 그러면서 웃는 얼굴로 만나는 사람들과 일일이 작별인사까지 했다. 노인은 우리 집에도 왔다. 자책감에 짓눌려 있었던 나는 원기를 되찾은 노인을 보자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아내가 냉장고에서 수박을 꺼내 대접하자 목이 말랐는지 정신없이 먹었다.
“선상님, 뜸부기 꼭 찾으씨요잉.”
노인이 손등으로 수박물이 묻은 입 주위를 쓰윽 훔치며 웃는 얼굴로 말했다. 가까이서 마주보니 노인의 눈이 살아온 연륜 만큼 맑고 깊다. 그 눈으로 내가 진정으로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꿰뚫어보는 것 같았다.
“글쎄요, 아마 못 찾을지도 모릅니다. 뜸부기 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은 있는데 보았다는 사람은 아직 없으니까요.”
“그래도 직심으로 찾다보면 꼭 보게 될 것이요.”
“글쎄요.”
나는 자신 없게 나지막이 말하며 직심(直心)이라는 말을 곱씹어 본다. 참으로 오랜만에 듣는 말이 아닌가. 직심이라는 말은 정직하다는 의미인데, 노인은 왜 내게 ‘열심히’ 라는 말 대신에 ‘직심’이라는 말을 썼을까, 머릿속이 혼란스럽다.
오영기는 새벽에 마을을 떠났다. 아무도 모르게 도망치듯 고향을 떠나버린 것이다. 초저녁에 이삿짐을 모두 차에 실어놓고 마을 사람들이 깊이 잠든 시각에 소리도 없이 떠나버린 것 같다.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보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을 때는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살림살이가 빠져나가고 사람의 체취가 사라져버린 빈 집은 살풍경할 정도로 을씨년스럽고 호젓했다. 마을 뒷산에서 기다랗게 누워 썩어가고 있는 죽은 소나무를 보았을 때처럼 마음이 쓰렁쓰렁했다.
빈집이 마을 사람들을 슬프게 했다.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실로 엄청났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차이만큼 멀고도 아련했다. 아련함은 곧 그리움이 되었다. 오영기와 그의 늙은 어머니, 멍질라와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부스럭거렸다. 이날따라 한껏 푸르러 보인 소나무 뒤로, 한번도 본 적이 없는 멍질라 친정어머니가 햇살처럼 웃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아내의 말대로 소나무는 땅을 박차고 비상을 서두르기라도 한 듯 두 날개를 쫙 편 학처럼 보였다. 두 개의 푸른 가지를 옆으로 뻗고 그 중심에서 하늘을 향해 뻗어 오른 튼실한 우듬지가 학의 목처럼 길었다.
“고향 떠나는 것이 죄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닌듸, 시상에 이러코롬 얼굴도 안 보이고 살째기 가부렀다냐? ”
“잘못한 것은 아녀도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제.”
나는 등 뒤에서 마을 사람들이 수런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도망치듯 몰래 마을을 떠나버린 오영기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떠나는 뒷모습을 보이기 싫은 오영기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아침을 먹으려는데 전화벨이 울려 받아보았더니 또 운곡리 최 노인이다. 지금 그의 논에서 뜸부기 여러 마리가 노닐고 있다는 것이다.
“뜸부기는 무슨 뜸부기가 있다는 겁니까? 당신 치매요? ”
나는 순간 짜증이 폭발해 전화를 끊어버리려다가 버럭 소리를 내질렀다.
“내 말을 고로코롬 믿지 않은 것을 보니께, 뜸부기 찾는다는 거 순전히 사기 아니여? ”
최 노인의 찌렁찌렁한 목소리가 쇠꼬챙이처럼 날아와 내 심장을 마구 찔러대는 것 같았다. 순간 가슴이 뻐개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나는 아침도 먹지 않고 곧장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섰다. 누릇누릇 벼가 익어가는 논다랑이를 눈 아래 두고 서둘러 골짜기를 빠져나가는데, 편백나무 숲이 우거진 산자락 밑 습 초지 쪽에서 뜸-뜸-뜸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급히 자전거를 세우고 귀를 기울여보았다. 분명 뜸부기 소리였다. 부리나케 개울을 건너 몸을 낮게 숨기고 습 초지 쪽으로 다가갔다. 뜸부기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그러나 아무리 주위를 샅샅이 찾아보아도 뜸부기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소리에 홀린 듯 넋을 잃고 습 초지로 뛰어 들어갔다. 뜸부기는 끝내 보이지 않았다. 소리 나는 곳에 돌멩이를 던져보았다. 그래도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숲 초지의 부들과 갈대 속에 몸을 낮추고 다시 귀를 기울여보았다. 뜸-뜸-뜸. 소리는 땅이 아닌 허공에서 들려왔다. 그것은 이승과 저승의 중간쯤에서 들려오는 영혼의 소리처럼 내 가슴에 메아리쳤다.
- 끝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