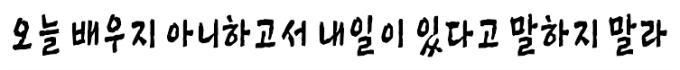소설 [소설]생오지 뜸부기(2회) – 문순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2,778회 작성일 10-04-01 17:56
본문
전편에 이어..
“정말로 뜸부기를 보셨습니까? ”
“아니 그러면 시방 내가 비싼 밥 묵고 거짓말이나 허겄어요.”
“어떻게 생겼던가요? ”
“꼭 달구새끼 같이 생겼는듸, 그 보담은 쬐끔 작고 대가리에 벼실이 맨드래미꽃 모양으로 삐럽디다.”
“몸 색깔은요? ”
“머시라고 허까, 밤색 허고 황토색 중간이라고나 허까.”
“우는 소리도 들었겠지요? ”
“하먼. 뜸-뜸- 뜸-.... 내가 젊었을 적에 들었던 소리 그대로드만요.”
“알았습니다. 지금 곧 운곡리로 가겠습니다.”
나는 부리나케 전화를 끊고 설레는 마음으로 카메라와 망원경부터 챙겼다. 어쩐지 이번에는 고대하던 뜸부기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로 가슴 설레며 집을 나섰다. 엉겁결에 자전거에 올라탔다가 다시 내려와 챙이 넓은 야구모자와 포켓용 소형 녹음기를 챙겨 나왔다.
나는 자전거를 타고 벚나무가 듬성듬성한 마을길을 빠져나갔다. 시골로 내려오면서 자동차를 없애고 자전거를 장만했다. 기계이면서 기계음이 전혀 없는 자전거는 시골길을 달리기에 딱 좋다. 햇살이 날카로워지면서 비포장 비탈길 산자락에서는 매미와 여치 소리가 낭자하다. 나는 매미소리에 발을 맞추어 천천히 패달을 밟으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린다.
뜸북뜸북 뜸북새/ 논에서 울고 / 뻐꾹뻐꾹 뻐꾹새/ 숲에서 울 때/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며/ 비단구두 사가지고 / 오신다더니/ 기럭기럭 기러기/ 북에서 오고/ 귓들귓들
귀뚜라미/ 슬피 울건만/ 서울 가신 오빠는 /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나는 언제나 이 노래를 2절까지 부른다. 시골로 내려오기 전 한동안은 가수 이선희와 조용필이 부른 이 노래의 카세트테이프를 사서 자동차를 탈 때마다 볼륨을 높이고 자주 들었던 적이 있다. 나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죽은 누나를 생각하곤 했다.
여섯 살 때, 강변에서 놀다가 사금파리에 발바닥을 벤 나는 한동안 누나의 등에 업혀 지냈다. 나보다 일곱 살이 더 많은 누나는 엄마처럼 나를 돌봤다. 그날도 나는 누나 등에 업혀 안산 끝자락 자갈밭에서 콩밭을 메는 엄마한테 새참을 가져가고 있었다. 나는 누나가 엄마한테 삶은 감자나 옥수수를 가지고 갈 때마다, 데려가 달라고 떼를 썼다. 엄마한테 가면 언제나 개똥참외나 오이. 가지를 따서 풀떨기 속에 감춰두었다가 내어주곤 했기 때문이다.
노두를 건넌 누나는 물방앗간을 지나 봇도랑을 따라 걸으면서 ‘오빠생각’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누나는 ‘오빠’를 ‘아빠’라고 불렀다. 누나는 ‘오빠’ 라고 불렀는데 내 귀에 ‘아빠’라고 들렸는지도 모른다. 그 무렵 내가 엄마한테 아빠 어디 계시냐고 물을라치면 엄마는 주저하지 않고 서울로 돈 벌로 갔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나는, 아빠는 내가 태어나던 해에 군에 입대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 채고 있었다. 누나도 우리 아빠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었다. 그래서 아빠 생각을 하면서 그 노래를 불렀을 지도. 누나는 논둑길을 걸으면서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그 노래를 불렀다.
누나는 방죽 아래 습 초지가 가까워지면 노래를 멈추곤 했다. 그곳에 뜸부기가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뜸-뜸-뜸 하고 우는 뜸부기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생김새가 영락없이 닭과 비슷했다. 갈색 몸통에 회색 얼룩이 져 있고 닭보다 긴 다리는 잿빛과 녹색을 하고 있었다. 수컷은 수탉처럼 붉은 깃을 달고 있었다.
어느 날은 뜸부기 소리가 들려온 초지에서, 사방이 왕골과 부들로 가려진 풀떨기 속에 큰 둥지 안에 12개나 되는 알을 발견했다. 누나와 나는 집에 돌아올 때 뜸부기 알 6개를 가져다 삶아 먹었다. 적갈색 무늬의 뜸부기 알은 달걀보다 약간 작고 비린내가 났지만 맛이 있었다.
누나와 나는 콩밭 메는 엄마한테 갈 때마다 뜸부기 둥지를 들여다보곤 했다. 남겨둔 6개의 알이 부화하여 새까만 솜털로 덮여 있었다. 얼마 후 새끼들은 모두 떠나버리고 없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여름, 누나는 엄마가 외할머니 회갑잔치에 가서 가져온 돼지고기를 먹고 며칠동안 설사를 하다가 죽고 말았다. 나는 누나가 죽은 것은 뜸부기 알을 훔쳐다 삶아먹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도 누나처럼 곧 죽게 될지도 몰라 늘 불안에 떨었다.
누나가 죽은 후부터 나는 뜸부기 소리가 싫었다. ‘오빠생각’ 노래도 부르지 않았다. 그 노래를 듣기 만해도 가슴이 저미는 듯 아프고 슬픔이 솟구쳤기 때문이다. 내가 그 노래를 다시 좋아한 것은 어른이 된 후부터다. 망각의 세월이 흘러 누나를 잃은 상처의 딱지가 떨어지고 그 자리에 새 살이 돋아나면서, 슬픔이 그리움으로 변한 것인지도 모른다.
5년 전,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자 불현듯 누나가 그리워서 나는 고향으로 달려갔었다. 어머니가 젊은 시절 아버지를 잃고 눈물과 땀으로 얼룩졌을 콩밭은 매실나무가 심어졌고 뜸부기가 살았던 습 초지에는 파라다이스라는 분홍빛 3층 모텔이 들어서 있었다. 초록빛 들판 한 가운데 분홍빛은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가슴에 구멍이 숭숭 뚫린 기분으로 한나절을 파라다이스 주변을 맴돌았으나 뜸부기 소리는 들을 수가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고향에서 6킬로쯤 떨어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생오지로 초등학교 시절 짝꿍을 만나러 갔다가, 그곳에서 뜸부기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 다시 뜸부기가 보고 싶어 도시 삶을 정리하고 아예 생오지로 옮겨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사 온 후 3년 내내 뜸부기는 다시 보지 못하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버스가 다니는 큰 길로 접어들자 매연과 함께 농약냄새가 확 덮쳐와 속이 메스꺼웠다. 이 길은 화순 온천 리조트 가는 길이라서 주말이면 자동차들이 줄을 잇는다. 며칠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인지 가로수로 심은 목련꽃 나무 잎에 부연 먼지가 켜켜이 쌓여있는 것이 보인다.
운곡리로 가자면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살았던 고향 마을을 지나야한다. 목련꽃 나무 가로수가 끝나는 지점에, 최근에 들어선 메디칼 리조트가 있고 그곳에서 조금 더 가서 다리 건너 주유소가 있는 마을이 내 고향이다. 샘 거리에 주유소와 청국장이 맛있는 식당이 생겼다. 마을 한 가운데 조붓한 돌담 고샅이 확 트인 2차선 도로로 변했다. 마을이 동강난 것 같다.
나는 넓은 주유소 앞길을 지날 때마다 유년시절의 내 몸뚱이가 토막 난 듯한 참담한 기분에 사로잡히곤 한다. 유년시절에 삶아 먹었던 뜸부기 알과 누나의 죽음, 그리고 마을을 둘로 쪼개놓은 2차선 도로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했다.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뜸부기를 찾아 시골로 내려온 후, 그 생각이 내 머리에 진득찰처럼 찰싹 달라붙어서 좀처럼 떨어져나가지 않았다. 내가 살던 때만해도 고향 마을은 70여 호가 넘었었는데 2차선 도로가 마을을 갈라놓은 후부터 자꾸만 줄어, 지금은 겨우 24호 밖에 살지 않는다.
나는 생오지를 떠나 30분쯤 후에 운곡리에 도착했다. 한여름 햇볕 속을 뚫고 패달을 밟았더니 온몸이 땀에 흠뻑 젖고 말았다. 뜸부기를 보았다는 사람이 마을 어귀 늙은 느티나무 밑 회색 기와를 올린 정자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반바지에 땟국에 절은 러닝셔츠 바람의 그는 머리가 허옇게 샌 팔순 노인이었다.
“뜸부기를 언제 어디서 보셨습니까? ”
수인사를 나눈 다음 물었다. 보통 키보다 약간 작고 수숫대처럼 마른 체격의 최 노인은 내 물음에 잠시 대답을 망설인 듯싶더니, 천천히 오른 손을 들어 개울 건너 산자락 끄트머리를 가리켰다. 정자에서 키 큰 미루나무 두 그루가 곧게 서 있는 산자락 끄트머리까지는 불과 2백 메타도 안 되는 거리였다.
“그러니께, 멋이냐, 어저께 해가 설핏헐 적에 저그 저... 미루나무 밑 우리 논에서 폴짝폴짝 뜀시로 뜸-뜸 허고 우는 것을 보았제.”
“논에서 보셨다고요? ”
“하먼. 논에 농약을 치다가 봤어.”
“농약이요? ”
“그려. 멸구 약을 쳤제. 헌듸 뜸부기 신고 허면 거시기 뭣 좀 안 주요? 간첩 신고 허면 보상금 주드끼...”
최 노인의 말에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시선을 멀리 던져 햇볕에 은빛으로 반짝이는 미루나무 잎을 바라보았다. 최 노인도 무척 뜸부기가 보고 싶은 모양이라고 생각하면서. 농약을 친 논에는 뜸부기가 살지도 오지도 않는다는 것을 최 노인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왜 뜸부기를 보았다고 내게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몰랐다.
그렇다고 나는 그냥 되돌아올 수가 없어, 최 노인을 따라 그가 분명 보았다는 미루나무 아래 논까지 가 보았다. 최 노인의 뒤를 따라가면서 나는 최 노인도 나도 같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쉽게 돌아설 수가 없었다. 뜸부기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나 말고 또 있다는 사실에 내 마음이 조금 너그러워진 것이다. 논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농약냄새가 코를 찔러 헛구역질이 나오려는 것을 가까스로 참으면서 그의 뒤를 바짝 따랐다. 우리들은 미루나무 그늘 밑으로 가까이 갔다.
“헌디, 뭣땜시 뜸부기를 찾는 게요?”
“뜸부기가 숨바꼭질의 선수라서요. 우리는 지금 숨바꼭질을 하고 있답니다.”
최 노인이 묻고 내가 대답했다. 헛걸음을 하게 된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엇된 말을 한 것이다. 그 때 최 노인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검지를 입술 중앙에 대고 한쪽 눈을 찡긋해 보이며 쉿 소리를 냈다. 최 노인이 논둑에 쪼그리고 앉자 나도 따라 앉았다. 최 노인은 두 손바닥을 펴서 귀 바퀴를 만들더니 산자락 끝으로 이어지는 논둑을 유심히 보았다.
“저 소리, 저 소리... 들리지요? 뜸-북, 뜸-북, 뜸-북, 뜸-북, 뜸-뜸-뜸....”
최 노인이 시선을 한 곳에 집중한 채 속삭이듯 말했다. 나도 최 노인처럼 손바닥으로 귀 바퀴를 만들고 귀를 기울였다. 개울물 소리가 가벼운 바람에 뒤섞이며 흐르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산자락 끝으로부터 시선을 거두어 눈앞의 최 노인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최 노인의 진지하면서도 허정(虛靜)한 표정에서 나는 그가 분명 내가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나는 최 노인이 1년 전에 아내가 죽고 혼자 외롭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때서야 나는 최 노인이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정말로 뜸부기를 보셨습니까? ”
“아니 그러면 시방 내가 비싼 밥 묵고 거짓말이나 허겄어요.”
“어떻게 생겼던가요? ”
“꼭 달구새끼 같이 생겼는듸, 그 보담은 쬐끔 작고 대가리에 벼실이 맨드래미꽃 모양으로 삐럽디다.”
“몸 색깔은요? ”
“머시라고 허까, 밤색 허고 황토색 중간이라고나 허까.”
“우는 소리도 들었겠지요? ”
“하먼. 뜸-뜸- 뜸-.... 내가 젊었을 적에 들었던 소리 그대로드만요.”
“알았습니다. 지금 곧 운곡리로 가겠습니다.”
나는 부리나케 전화를 끊고 설레는 마음으로 카메라와 망원경부터 챙겼다. 어쩐지 이번에는 고대하던 뜸부기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로 가슴 설레며 집을 나섰다. 엉겁결에 자전거에 올라탔다가 다시 내려와 챙이 넓은 야구모자와 포켓용 소형 녹음기를 챙겨 나왔다.
나는 자전거를 타고 벚나무가 듬성듬성한 마을길을 빠져나갔다. 시골로 내려오면서 자동차를 없애고 자전거를 장만했다. 기계이면서 기계음이 전혀 없는 자전거는 시골길을 달리기에 딱 좋다. 햇살이 날카로워지면서 비포장 비탈길 산자락에서는 매미와 여치 소리가 낭자하다. 나는 매미소리에 발을 맞추어 천천히 패달을 밟으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린다.
뜸북뜸북 뜸북새/ 논에서 울고 / 뻐꾹뻐꾹 뻐꾹새/ 숲에서 울 때/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며/ 비단구두 사가지고 / 오신다더니/ 기럭기럭 기러기/ 북에서 오고/ 귓들귓들
귀뚜라미/ 슬피 울건만/ 서울 가신 오빠는 /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나는 언제나 이 노래를 2절까지 부른다. 시골로 내려오기 전 한동안은 가수 이선희와 조용필이 부른 이 노래의 카세트테이프를 사서 자동차를 탈 때마다 볼륨을 높이고 자주 들었던 적이 있다. 나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죽은 누나를 생각하곤 했다.
여섯 살 때, 강변에서 놀다가 사금파리에 발바닥을 벤 나는 한동안 누나의 등에 업혀 지냈다. 나보다 일곱 살이 더 많은 누나는 엄마처럼 나를 돌봤다. 그날도 나는 누나 등에 업혀 안산 끝자락 자갈밭에서 콩밭을 메는 엄마한테 새참을 가져가고 있었다. 나는 누나가 엄마한테 삶은 감자나 옥수수를 가지고 갈 때마다, 데려가 달라고 떼를 썼다. 엄마한테 가면 언제나 개똥참외나 오이. 가지를 따서 풀떨기 속에 감춰두었다가 내어주곤 했기 때문이다.
노두를 건넌 누나는 물방앗간을 지나 봇도랑을 따라 걸으면서 ‘오빠생각’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누나는 ‘오빠’를 ‘아빠’라고 불렀다. 누나는 ‘오빠’ 라고 불렀는데 내 귀에 ‘아빠’라고 들렸는지도 모른다. 그 무렵 내가 엄마한테 아빠 어디 계시냐고 물을라치면 엄마는 주저하지 않고 서울로 돈 벌로 갔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나는, 아빠는 내가 태어나던 해에 군에 입대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 채고 있었다. 누나도 우리 아빠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었다. 그래서 아빠 생각을 하면서 그 노래를 불렀을 지도. 누나는 논둑길을 걸으면서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그 노래를 불렀다.
누나는 방죽 아래 습 초지가 가까워지면 노래를 멈추곤 했다. 그곳에 뜸부기가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뜸-뜸-뜸 하고 우는 뜸부기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생김새가 영락없이 닭과 비슷했다. 갈색 몸통에 회색 얼룩이 져 있고 닭보다 긴 다리는 잿빛과 녹색을 하고 있었다. 수컷은 수탉처럼 붉은 깃을 달고 있었다.
어느 날은 뜸부기 소리가 들려온 초지에서, 사방이 왕골과 부들로 가려진 풀떨기 속에 큰 둥지 안에 12개나 되는 알을 발견했다. 누나와 나는 집에 돌아올 때 뜸부기 알 6개를 가져다 삶아 먹었다. 적갈색 무늬의 뜸부기 알은 달걀보다 약간 작고 비린내가 났지만 맛이 있었다.
누나와 나는 콩밭 메는 엄마한테 갈 때마다 뜸부기 둥지를 들여다보곤 했다. 남겨둔 6개의 알이 부화하여 새까만 솜털로 덮여 있었다. 얼마 후 새끼들은 모두 떠나버리고 없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여름, 누나는 엄마가 외할머니 회갑잔치에 가서 가져온 돼지고기를 먹고 며칠동안 설사를 하다가 죽고 말았다. 나는 누나가 죽은 것은 뜸부기 알을 훔쳐다 삶아먹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도 누나처럼 곧 죽게 될지도 몰라 늘 불안에 떨었다.
누나가 죽은 후부터 나는 뜸부기 소리가 싫었다. ‘오빠생각’ 노래도 부르지 않았다. 그 노래를 듣기 만해도 가슴이 저미는 듯 아프고 슬픔이 솟구쳤기 때문이다. 내가 그 노래를 다시 좋아한 것은 어른이 된 후부터다. 망각의 세월이 흘러 누나를 잃은 상처의 딱지가 떨어지고 그 자리에 새 살이 돋아나면서, 슬픔이 그리움으로 변한 것인지도 모른다.
5년 전,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자 불현듯 누나가 그리워서 나는 고향으로 달려갔었다. 어머니가 젊은 시절 아버지를 잃고 눈물과 땀으로 얼룩졌을 콩밭은 매실나무가 심어졌고 뜸부기가 살았던 습 초지에는 파라다이스라는 분홍빛 3층 모텔이 들어서 있었다. 초록빛 들판 한 가운데 분홍빛은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가슴에 구멍이 숭숭 뚫린 기분으로 한나절을 파라다이스 주변을 맴돌았으나 뜸부기 소리는 들을 수가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고향에서 6킬로쯤 떨어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생오지로 초등학교 시절 짝꿍을 만나러 갔다가, 그곳에서 뜸부기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 다시 뜸부기가 보고 싶어 도시 삶을 정리하고 아예 생오지로 옮겨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사 온 후 3년 내내 뜸부기는 다시 보지 못하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버스가 다니는 큰 길로 접어들자 매연과 함께 농약냄새가 확 덮쳐와 속이 메스꺼웠다. 이 길은 화순 온천 리조트 가는 길이라서 주말이면 자동차들이 줄을 잇는다. 며칠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인지 가로수로 심은 목련꽃 나무 잎에 부연 먼지가 켜켜이 쌓여있는 것이 보인다.
운곡리로 가자면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살았던 고향 마을을 지나야한다. 목련꽃 나무 가로수가 끝나는 지점에, 최근에 들어선 메디칼 리조트가 있고 그곳에서 조금 더 가서 다리 건너 주유소가 있는 마을이 내 고향이다. 샘 거리에 주유소와 청국장이 맛있는 식당이 생겼다. 마을 한 가운데 조붓한 돌담 고샅이 확 트인 2차선 도로로 변했다. 마을이 동강난 것 같다.
나는 넓은 주유소 앞길을 지날 때마다 유년시절의 내 몸뚱이가 토막 난 듯한 참담한 기분에 사로잡히곤 한다. 유년시절에 삶아 먹었던 뜸부기 알과 누나의 죽음, 그리고 마을을 둘로 쪼개놓은 2차선 도로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했다.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뜸부기를 찾아 시골로 내려온 후, 그 생각이 내 머리에 진득찰처럼 찰싹 달라붙어서 좀처럼 떨어져나가지 않았다. 내가 살던 때만해도 고향 마을은 70여 호가 넘었었는데 2차선 도로가 마을을 갈라놓은 후부터 자꾸만 줄어, 지금은 겨우 24호 밖에 살지 않는다.
나는 생오지를 떠나 30분쯤 후에 운곡리에 도착했다. 한여름 햇볕 속을 뚫고 패달을 밟았더니 온몸이 땀에 흠뻑 젖고 말았다. 뜸부기를 보았다는 사람이 마을 어귀 늙은 느티나무 밑 회색 기와를 올린 정자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반바지에 땟국에 절은 러닝셔츠 바람의 그는 머리가 허옇게 샌 팔순 노인이었다.
“뜸부기를 언제 어디서 보셨습니까? ”
수인사를 나눈 다음 물었다. 보통 키보다 약간 작고 수숫대처럼 마른 체격의 최 노인은 내 물음에 잠시 대답을 망설인 듯싶더니, 천천히 오른 손을 들어 개울 건너 산자락 끄트머리를 가리켰다. 정자에서 키 큰 미루나무 두 그루가 곧게 서 있는 산자락 끄트머리까지는 불과 2백 메타도 안 되는 거리였다.
“그러니께, 멋이냐, 어저께 해가 설핏헐 적에 저그 저... 미루나무 밑 우리 논에서 폴짝폴짝 뜀시로 뜸-뜸 허고 우는 것을 보았제.”
“논에서 보셨다고요? ”
“하먼. 논에 농약을 치다가 봤어.”
“농약이요? ”
“그려. 멸구 약을 쳤제. 헌듸 뜸부기 신고 허면 거시기 뭣 좀 안 주요? 간첩 신고 허면 보상금 주드끼...”
최 노인의 말에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시선을 멀리 던져 햇볕에 은빛으로 반짝이는 미루나무 잎을 바라보았다. 최 노인도 무척 뜸부기가 보고 싶은 모양이라고 생각하면서. 농약을 친 논에는 뜸부기가 살지도 오지도 않는다는 것을 최 노인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왜 뜸부기를 보았다고 내게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몰랐다.
그렇다고 나는 그냥 되돌아올 수가 없어, 최 노인을 따라 그가 분명 보았다는 미루나무 아래 논까지 가 보았다. 최 노인의 뒤를 따라가면서 나는 최 노인도 나도 같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쉽게 돌아설 수가 없었다. 뜸부기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나 말고 또 있다는 사실에 내 마음이 조금 너그러워진 것이다. 논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농약냄새가 코를 찔러 헛구역질이 나오려는 것을 가까스로 참으면서 그의 뒤를 바짝 따랐다. 우리들은 미루나무 그늘 밑으로 가까이 갔다.
“헌디, 뭣땜시 뜸부기를 찾는 게요?”
“뜸부기가 숨바꼭질의 선수라서요. 우리는 지금 숨바꼭질을 하고 있답니다.”
최 노인이 묻고 내가 대답했다. 헛걸음을 하게 된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엇된 말을 한 것이다. 그 때 최 노인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검지를 입술 중앙에 대고 한쪽 눈을 찡긋해 보이며 쉿 소리를 냈다. 최 노인이 논둑에 쪼그리고 앉자 나도 따라 앉았다. 최 노인은 두 손바닥을 펴서 귀 바퀴를 만들더니 산자락 끝으로 이어지는 논둑을 유심히 보았다.
“저 소리, 저 소리... 들리지요? 뜸-북, 뜸-북, 뜸-북, 뜸-북, 뜸-뜸-뜸....”
최 노인이 시선을 한 곳에 집중한 채 속삭이듯 말했다. 나도 최 노인처럼 손바닥으로 귀 바퀴를 만들고 귀를 기울였다. 개울물 소리가 가벼운 바람에 뒤섞이며 흐르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산자락 끝으로부터 시선을 거두어 눈앞의 최 노인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최 노인의 진지하면서도 허정(虛靜)한 표정에서 나는 그가 분명 내가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나는 최 노인이 1년 전에 아내가 죽고 혼자 외롭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때서야 나는 최 노인이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