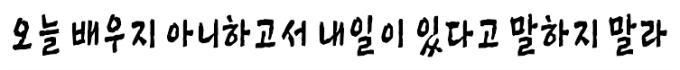수필 [수필]드디어 안개가 왔다 – 김은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2,941회 작성일 10-04-01 17:47
본문
느닷없이 축령산에 있는 산장에 열흘쯤 박혀 있겠다며 떠난 지인이 있다. 지난 생일날 드라이브 길을 그쪽으로 잡을까 했으나 사실 썩 가고 싶지 않아 미뤘었다. 복닥거리는 데서 정신을 소모하는 게 지겨워져 편히 쉬고 싶다고 떠난 그이에게 샘을 낸 것이다. 그렇게 훌쩍 떠나도 좋을, 자식 다 키워놓고 걸핏하면 출장 중인 남편을 둔 그이 처지가 항상 부럽기만 했다.
쉬고 싶다니까 철저히 쉬라고, 괜히 고요를 흩트리지는 말자고 혼자 핑계를 만들었다. 그런데 지난밤, 한 달 더 연장 계약을 하겠다는 메시지가 왔다. 있다 보니 떠나고 싶지 않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했다. 갑자기 심통이 났다. 가서 마구 마구 휘젓고 와야지, 잠들기 전에 그 생각을 했다. 그리고 눈 뜨자마자 거기 갈 계획부터 떠올렸다. 잘 찾아갈 수 있을까 몰라….
등교하려고 나서는 애를 따라 문을 열었더니 온통 잿빛이었다. 아직 덜 밝은 새벽을 휘감는 안개. 봄이 시작될 때마다, 그리고 가을이 깊어가면서 어김없이 덮어오는 안개를 매번 잊고 있다가 맞닥뜨리고서야 아하 한다. 마치 눈에 엷은 막이라도 낀 듯 세상이 몽롱하니 연방 눈을 비벼보지만 어림없다. 원인이 밖에 있는 것을 안에서 찾으려 하고, 안에 있는 이유를 무시하고 바깥 탓만 하고…. 이것이 미련한 내 처신이다.
어디 나뿐이랴, 많은 이가 그러하게 사는 것을. 아무튼 다른 때보다 천천히 가다 보니 버스 정류장 도착하자 바로 그 버스가 떠나는 꽁무니를 보았다. 그거 놓치면 자칫 1교시에 늦는데…. 아이가 애앵 망연한 탄식을 했다. 다음 차는 15분 후다. 출근시간 15분은 자칫 30분 이상 늦어지게 만든다. 얼른 타, 어리둥절한 아이를 재촉해 태우고서 버스를 따라 달렸다. 그나마 국도는 차가 많이 다녀서 그런지 안개가 얼쩡거리기만 할 뿐 얼추 저만치 달리는 차들은 보였다.
그래도 무리하지는 못하고, 이른 시각에 벌써 달려나온 온갖 덤프트럭이며 레미콘이며 묵직하니 느려터진 차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두 정류장 건너뛰고 세 번째에 세우자 이내 버스가 뒤꽁무니에 붙어 섰다. 아이는 부리나케 내려 버스로 뛰어가고, 그걸 보다가 유턴을 하려니 쉽지 않았다. 반대차선은 출근하는 차들로 꽉 메워져 있어 끼어들기가 쉽지 않은 것이었다. 그래도 어찌어찌 비비고 붙어서 간신히 돌아왔다. 국도를 벗어나자마자 다시 덮치는 안개…. 푸른 빛 섞인 잿빛으로 세상은 아직 어둡다.
다른 때보다 더 꾸무럭거리는 남편 때문에 신경질 나는 것을 억지로 눌러 참다가 나섰더니 그 잠깐 사이에 안개는 더 두꺼워졌다. 이제는 국도마저 묵직한 커튼을 드리워 신호등도 구별되지 않았다. 뒤에 탄 남자는 늦는다며 안달을 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그 안개막을 찢을 수는 없는 터, 절대 느긋하지도 못하게 긴장한 채로 굴러가는데 앞으로 차 한 대가 확 다가왔다.
간신히 서줘도 핑하니 달려가 버리는 예의 없는 그 차 뒤에 꿍얼꿍얼 욕을 한 바가지 퍼붓고 출발하려는 순간 또 코앞에 들이미는 차 한 대. 등도 켜지 않고 안개 낀 아침에 꼬불꼬불 시골 안길을 질주하는 차들이라니, 징그러운 것들. 저희 목숨이야 하늘이 보살피는지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 연방 모골이 송연해진 채로 더듬더듬 간신히 가 내려놓고 다시 돌아오는 길은 아예 사라지고 없었다. 불과 5분 10분 사이에 안개는 꾸역꾸역 내려앉았다.
햇님이 뜨기는 떴다. 동그랗게 분홍빛으로 마치 제가 달님인 듯 시치미 떼고 거기 서서 빙글빙글 웃고 있었다. 눈부시지 않아 안심하고 째려봤다. 그러다 문득, 어, 산이 없네, 깨달았다. 집 뒤쪽으로 버티고 서 있는 향적산이 사라졌다. 그제야 비로소 축령산 생각이 났다. 향적산 올라 줄기줄기 따라가면 이어서 있을 축령산, 그것마저도 사라지고 없을 터이다.
보아하니 저 햇님 기운으로는 이내 안개를 녹이지는 못할 것 같다. 그렇다면 축령산은 물 건너갔다. 익은 길마저도 이렇게 더듬거리는 차에 낯선 산길을 어찌 찾을 거나. 느지막이 나서면 얼마 있지도 못하고 돌아와야 할 터, 오늘은 말아야겠다. 앞으로 한 달이나 남았으니까. 대신 광릉 가는 길 있는 토방이나 찾아야지.
오늘이 화요일이니 서울 사는 그 지인이 들어오는 날이겠다. 반년은 못 보았는데 오랜만에 그 회포나 풀어볼까. 내 딸 대학 입학한 것도 알리지 않았는데 이참에 자랑도 할 겸. 그렇게 결정을 하고, 산이 있을 그 자리에다 메롱 하고 마당에 들어섰다.
자세히 보니 하얀 점점이 흔들렸다. 음, 다닥냉이가 꽃을 달기 시작했네. 목련에도 개나리에도 물오르는 기미는 보이지도 않는데 여리디여린 저것들이 먼저 기지개를 켜는구나.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붓꽃 잎이며 원추리 잎이 이제 막 땅에서 솟아나기 시작한다. 겨울 동안 잊었던 이름들을 하나하나 꼽아보며 휘휘 둘러보았다.
갑자기 패딩파카가 버거워졌다. 부르릉 트럭 한 대가 지나가면서 안개를 흔들어놓았다. 저절로 오르르 어깨가 떨렸다. 어제 그 무시무시한 황사, 그 찌꺼기를 몽땅 휘어 안고 내렸을 안개다. 이대로 서 있는 건 좋은 게 못 되겠다.
띵똥 메시지가 왔다. 까치 세 마리와 까마귀 두 마리가 길에서 싸워요. 서울 들어서는 길목이라 그런가 거기에도 그런 것이 있나 보네. 서울에는 안개 없니, 어째 그런 것마저 보인다니. 여기는 안개 없어요. 진작에 돌린 세탁기가 탈수하겠다고 시끄럽게 몸을 터는 소리가 들려온다.
아아 저 소리, 저런 소리 듣지 말고 어디 퍼질러 앉아 손등이 새빨개지도록 흐르는 물에다 빨래를 담궈 빨았으면 좋겠다. 빌어먹을. 그런 빨래는커녕 세탁기가 게워낸 것마저 옥상 빨랫줄에 널지도 못할 텐데. 어제 황사로 빨랫줄은 싯누럴 것이다. 황사 아니더라도 이제 막 시작된 사방 공사판에서 날아오는 흙먼지는 오죽하겠는가. 논밭 일구는 먼지 아니요 논밭 메우는 먼지, 거기에 무언가 묵직한 건물 세우는 먼지. 무심코 가느다랗게 한숨이 나왔다.
나는 이 동네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어디로까지 숨어 들어가 야나 봄에도 마음대로 빨래를 널 수 있을까. 축령산은 얼마나 깊지. 거기에 내가 숨어들 장소 있을까. 오래 숨어 있을 수나 있을까. 부엌 쪽창으로 보이는 바깥엔 여전히 아무것도 없다. 그냥 짙은 안개뿐이다.
차라리 이렇게 덮어 버린 채로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다. 보이는 게 너무 많아, 그것들이 쉼 없이 바뀌어 마음자리 들여다볼 것을 자꾸 잊는다. 축령산을 찾아간 지인의 기분을 알겠다. 경제적 부담으로 버거워하면서도 10년이나 토방을 버리지 못하는 지인의 마음을 알겠다. 그들처럼 도시에 살지 않으면서도 나도 나를 들여다볼 시간이 필요하다. 안개 저쪽 보겠노라고 눈 비비지 말고 내 안이나 들여다보도록 눈 감아야겠다.
쉬고 싶다니까 철저히 쉬라고, 괜히 고요를 흩트리지는 말자고 혼자 핑계를 만들었다. 그런데 지난밤, 한 달 더 연장 계약을 하겠다는 메시지가 왔다. 있다 보니 떠나고 싶지 않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했다. 갑자기 심통이 났다. 가서 마구 마구 휘젓고 와야지, 잠들기 전에 그 생각을 했다. 그리고 눈 뜨자마자 거기 갈 계획부터 떠올렸다. 잘 찾아갈 수 있을까 몰라….
등교하려고 나서는 애를 따라 문을 열었더니 온통 잿빛이었다. 아직 덜 밝은 새벽을 휘감는 안개. 봄이 시작될 때마다, 그리고 가을이 깊어가면서 어김없이 덮어오는 안개를 매번 잊고 있다가 맞닥뜨리고서야 아하 한다. 마치 눈에 엷은 막이라도 낀 듯 세상이 몽롱하니 연방 눈을 비벼보지만 어림없다. 원인이 밖에 있는 것을 안에서 찾으려 하고, 안에 있는 이유를 무시하고 바깥 탓만 하고…. 이것이 미련한 내 처신이다.
어디 나뿐이랴, 많은 이가 그러하게 사는 것을. 아무튼 다른 때보다 천천히 가다 보니 버스 정류장 도착하자 바로 그 버스가 떠나는 꽁무니를 보았다. 그거 놓치면 자칫 1교시에 늦는데…. 아이가 애앵 망연한 탄식을 했다. 다음 차는 15분 후다. 출근시간 15분은 자칫 30분 이상 늦어지게 만든다. 얼른 타, 어리둥절한 아이를 재촉해 태우고서 버스를 따라 달렸다. 그나마 국도는 차가 많이 다녀서 그런지 안개가 얼쩡거리기만 할 뿐 얼추 저만치 달리는 차들은 보였다.
그래도 무리하지는 못하고, 이른 시각에 벌써 달려나온 온갖 덤프트럭이며 레미콘이며 묵직하니 느려터진 차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두 정류장 건너뛰고 세 번째에 세우자 이내 버스가 뒤꽁무니에 붙어 섰다. 아이는 부리나케 내려 버스로 뛰어가고, 그걸 보다가 유턴을 하려니 쉽지 않았다. 반대차선은 출근하는 차들로 꽉 메워져 있어 끼어들기가 쉽지 않은 것이었다. 그래도 어찌어찌 비비고 붙어서 간신히 돌아왔다. 국도를 벗어나자마자 다시 덮치는 안개…. 푸른 빛 섞인 잿빛으로 세상은 아직 어둡다.
다른 때보다 더 꾸무럭거리는 남편 때문에 신경질 나는 것을 억지로 눌러 참다가 나섰더니 그 잠깐 사이에 안개는 더 두꺼워졌다. 이제는 국도마저 묵직한 커튼을 드리워 신호등도 구별되지 않았다. 뒤에 탄 남자는 늦는다며 안달을 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그 안개막을 찢을 수는 없는 터, 절대 느긋하지도 못하게 긴장한 채로 굴러가는데 앞으로 차 한 대가 확 다가왔다.
간신히 서줘도 핑하니 달려가 버리는 예의 없는 그 차 뒤에 꿍얼꿍얼 욕을 한 바가지 퍼붓고 출발하려는 순간 또 코앞에 들이미는 차 한 대. 등도 켜지 않고 안개 낀 아침에 꼬불꼬불 시골 안길을 질주하는 차들이라니, 징그러운 것들. 저희 목숨이야 하늘이 보살피는지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 연방 모골이 송연해진 채로 더듬더듬 간신히 가 내려놓고 다시 돌아오는 길은 아예 사라지고 없었다. 불과 5분 10분 사이에 안개는 꾸역꾸역 내려앉았다.
햇님이 뜨기는 떴다. 동그랗게 분홍빛으로 마치 제가 달님인 듯 시치미 떼고 거기 서서 빙글빙글 웃고 있었다. 눈부시지 않아 안심하고 째려봤다. 그러다 문득, 어, 산이 없네, 깨달았다. 집 뒤쪽으로 버티고 서 있는 향적산이 사라졌다. 그제야 비로소 축령산 생각이 났다. 향적산 올라 줄기줄기 따라가면 이어서 있을 축령산, 그것마저도 사라지고 없을 터이다.
보아하니 저 햇님 기운으로는 이내 안개를 녹이지는 못할 것 같다. 그렇다면 축령산은 물 건너갔다. 익은 길마저도 이렇게 더듬거리는 차에 낯선 산길을 어찌 찾을 거나. 느지막이 나서면 얼마 있지도 못하고 돌아와야 할 터, 오늘은 말아야겠다. 앞으로 한 달이나 남았으니까. 대신 광릉 가는 길 있는 토방이나 찾아야지.
오늘이 화요일이니 서울 사는 그 지인이 들어오는 날이겠다. 반년은 못 보았는데 오랜만에 그 회포나 풀어볼까. 내 딸 대학 입학한 것도 알리지 않았는데 이참에 자랑도 할 겸. 그렇게 결정을 하고, 산이 있을 그 자리에다 메롱 하고 마당에 들어섰다.
자세히 보니 하얀 점점이 흔들렸다. 음, 다닥냉이가 꽃을 달기 시작했네. 목련에도 개나리에도 물오르는 기미는 보이지도 않는데 여리디여린 저것들이 먼저 기지개를 켜는구나.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붓꽃 잎이며 원추리 잎이 이제 막 땅에서 솟아나기 시작한다. 겨울 동안 잊었던 이름들을 하나하나 꼽아보며 휘휘 둘러보았다.
갑자기 패딩파카가 버거워졌다. 부르릉 트럭 한 대가 지나가면서 안개를 흔들어놓았다. 저절로 오르르 어깨가 떨렸다. 어제 그 무시무시한 황사, 그 찌꺼기를 몽땅 휘어 안고 내렸을 안개다. 이대로 서 있는 건 좋은 게 못 되겠다.
띵똥 메시지가 왔다. 까치 세 마리와 까마귀 두 마리가 길에서 싸워요. 서울 들어서는 길목이라 그런가 거기에도 그런 것이 있나 보네. 서울에는 안개 없니, 어째 그런 것마저 보인다니. 여기는 안개 없어요. 진작에 돌린 세탁기가 탈수하겠다고 시끄럽게 몸을 터는 소리가 들려온다.
아아 저 소리, 저런 소리 듣지 말고 어디 퍼질러 앉아 손등이 새빨개지도록 흐르는 물에다 빨래를 담궈 빨았으면 좋겠다. 빌어먹을. 그런 빨래는커녕 세탁기가 게워낸 것마저 옥상 빨랫줄에 널지도 못할 텐데. 어제 황사로 빨랫줄은 싯누럴 것이다. 황사 아니더라도 이제 막 시작된 사방 공사판에서 날아오는 흙먼지는 오죽하겠는가. 논밭 일구는 먼지 아니요 논밭 메우는 먼지, 거기에 무언가 묵직한 건물 세우는 먼지. 무심코 가느다랗게 한숨이 나왔다.
나는 이 동네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어디로까지 숨어 들어가 야나 봄에도 마음대로 빨래를 널 수 있을까. 축령산은 얼마나 깊지. 거기에 내가 숨어들 장소 있을까. 오래 숨어 있을 수나 있을까. 부엌 쪽창으로 보이는 바깥엔 여전히 아무것도 없다. 그냥 짙은 안개뿐이다.
차라리 이렇게 덮어 버린 채로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다. 보이는 게 너무 많아, 그것들이 쉼 없이 바뀌어 마음자리 들여다볼 것을 자꾸 잊는다. 축령산을 찾아간 지인의 기분을 알겠다. 경제적 부담으로 버거워하면서도 10년이나 토방을 버리지 못하는 지인의 마음을 알겠다. 그들처럼 도시에 살지 않으면서도 나도 나를 들여다볼 시간이 필요하다. 안개 저쪽 보겠노라고 눈 비비지 말고 내 안이나 들여다보도록 눈 감아야겠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