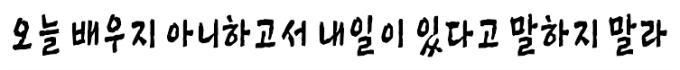수필 [수필] 달 (김윤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3,425회 작성일 10-06-06 14:55
본문
달
창문너머 달빛이 유별나다. 엊그제가 대보름날이었던 걸 생각하니 고국의 달 인양 부드럽고 그윽하다. 붉지도 희지도 않은 맑은 달빛이 올해도 풍년을 기약할 성싶다.
매일 밤 모양을 달리하며 두둥실 떠다니는 달은 퍽이나 한가롭다. 어쩜 그건 우리네 가슴속에 숨어있는 방랑벽을 대신하기도 하고, 모습을 달리하며 살고 싶은 고달픈 삶을 대신하는 듯도 하다. 바라보기만 해도 제 빛을 나눠주는 달, 그 빛을 받고 있으면 어느 새 내가 밤하늘에 훌쩍 올라앉은 듯하다.
달의 모양은 천체의 법칙에 의해서 라지만 그래도 스스로 모양이 변한다고 생각하는 게 더 그럴 듯하다. 어제에 비해 오늘 좀 더 자란 모습이 그러하다. 인간이 달에 첫발을 내딛었을 때 옥토끼의 계수나무 꿈은 금세 사라질 듯하더니 오늘도 여전한 걸 보면 두고두고 사라지지 않을 우리의 꿈 때문이지 싶다.
초승달은 갓 태어난 아기 모습 같다. 아직 젖내조차 가시지 않은 신생아 말이다. 눈도 뜨지 못해 꼬물거리지만 한 해 동안 자라는 성장이 얼마나 경이로운가. 초승달은 그런 모습이다. 초승달을 바라보고 있으면 눈이 시리다. 밤하늘이 너무 광활하다. 그러나 진작 홀로 서기를 깨달은 것일까, 이미 제 빛을 낼 줄 아는 것을 보면. 토실해져 가는 종아리에서 삶을 살아가는 용기와 지혜를 본다.
상현달은 어른이 되고 싶은 사춘기 아이 모습이다. 경기 침체니 대학 입시니 해서 꿈과 갈등을 함께 겪고 있지만 그래도 빨리빨리 자라고 싶은 아이들의 모습이다. 여백 속에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있다.
보름달은 인생의 정점이다. 꿈과 실천이 함께 어우러진 청년기의 모습이다. 그래서인지 보름달은 꿈과 낭만으로 전설을 만들어 낸다. 그런데 달빛이 햇빛의 반사라면 달은 그저 제 스스로를 밤하늘에 투영시킨 빈 마음인가 보다. 어쩜 밤하늘이 아늑하고 풍요롭게 느껴지는 것도 달이 주는 빈 마음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하필이면 가장 둥근 달인 대보름날에 소원을 비는 것도 달의 마음 비우기 작업을 배우려는 것이리라.
하현달은 훌쩍 중년의 길목에 들어선 내 모습이다. 인생의 한 획을 긋기는 했으나 아직 할 일이 많은 때다. 정신은 풍부하고 맑아야 하지만 여의찮다. 땀 흘려 일한 보람은 함께 나누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듯 제 몫을 줄여 나갈 때다. 삶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너그러움이다. 고통을 나누는 것에도 받아들이는 것에도 겸허해 할 줄 안다. 삶을 사랑하는 여유와 세월 속에 담긴 또 다른 의미를 깨달을 줄도 안다. 눈가의 주름과 희끗희끗한 흰머리가 결코 헛된 세월이 아니었음을 느끼고 싶어한다. 이때쯤은 체념도 배워야 할 때인 듯싶다.
그믐달은 새벽녘에 칼날 같은 빛을 안고 있어 누군가는 미인의 아미라고도 노래했고 과수의 한이라고도 노래하지 않았던가. 삶을 정리하는 노년의 정기가 때론 저렇게 정갈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젊은 날, 우리는 가까운 바닷가에서 대보름 달맞이를 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꿈을 소원하며 함께 달을 바라보는 일은 진작부터 흥분됐다. 우리는 사람들 속에 섞여 들뜬 마음으로 한참을 기다렸다. 때마침 동해 바다의 수평선을 뒤덮은 구름 때문에 달은 기색도 없이 솟았다가 주위가 어둑해지고 나서야 제 모습을 드러냈다. 달의 모습은 참으로 단아했다. 그러나 어느 한 곳 이지러진 구석 없이 휘영청 떠오른 달은 사람들의 소원을 담기 보다 너희들의 하기 나름이라는 냉소를 담고 있는 듯했다. 동해 바다의 두텁고 육중한 물길을 뚫고 홀연히 그 몸체를 드러내야 하는 고통은 아름다움보다 어떤 절절함이 배여 있었다. 절제된 단아함, 그건 마치 상복 입은 여인의 아름다움 같은 것이었다. 안으로 울음을 삼키고 있는 그건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두들 탄성을 자아냈고 저마다 두 손 모아 소원을 빌었다. 가족의 건강을 소원하고 미래의 평안을 소원하는 무게들이 힘겨웠던지 달은 잠시 구름 뒤로 비껴 섰다. 너도나도 소원을 비는 것이 채 끝나지도 않아 마음을 졸였으나 정작 구름을 걷고 나온 달은 의연했다. 사람들의 소원이 밤바다를 메웠지만 달은 교교히 떠 있었다. 그날 밤 내내 달은 그렇게 교만스러웠다.
정월 대보름 달이 교만했듯 내 젊은 날도 그러했다. 우리의 앞날은 행복만이 가득할 줄 알았다. 그러나 오만함 뒤의 빈자리가 얼마나 초라한 것이지 그것을 깨닫는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어쩜 보름달이 그처럼 교교히 빛났던 건 아마도 초라한 뒷모습을 감추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나 싶다.
쉬 끝나리라 여겼던 우리의 젊은 계획은 좀체 결과를 이루지 못했다. 젊음의 만용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삶에 대한 교만함 때문이었는지 결과는 해마다 빗나갔다. 남편은 점점 어깨에 힘을 잃어갔고 나는 나대로 꿈이 바래져 갔다. 그때 나는 달에게 소원을 빌곤 했는데 비껴 가는 소원 때문에 둥근 달이 꼭 심통 사나운 뺑덕 어미의 얼굴처럼 보였다. 무심하니 슬렁슬렁 지나는 한가로운 달을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에서 잊혀지고 있는 듯한 서러움에 그렇게 탓하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구름을 걷고 나온 보름달이 의연했듯 우리도 그런 의연함을 닮고 싶었다. 우린 많은 것을 떠나 보냈지만 여전히 많은 것이 남아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떠난 것을 슬퍼할 게 아니라 새로 태어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기다릴 줄 아는 자연의 너그러움에 비하면 재촉해 달려나가는 건 오직 인간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달은 부드럽고 따뜻하다. 그리고 너그럽고 포근하다. 어쩜 그건 세상의 불 밝기가 되어오는 동안 체득한 삶의 질곡 탓이리라. 그러고 보니 밤하늘의 달이 아름다운 건 이미 내일의 모습을 아는 까닭이 아닐까. 빈자리를 채울 줄도 만들 줄도 아는 달의 모습에서 우리는 저마다의 미래를 보는 성싶다.
죽음이 한 생의 육신을 거두어도 언젠가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아는 것처럼 달의 윤회는 기다림을 가르쳐 주는 삶의 스승이라는 생각이 든다. ●
창문너머 달빛이 유별나다. 엊그제가 대보름날이었던 걸 생각하니 고국의 달 인양 부드럽고 그윽하다. 붉지도 희지도 않은 맑은 달빛이 올해도 풍년을 기약할 성싶다.
매일 밤 모양을 달리하며 두둥실 떠다니는 달은 퍽이나 한가롭다. 어쩜 그건 우리네 가슴속에 숨어있는 방랑벽을 대신하기도 하고, 모습을 달리하며 살고 싶은 고달픈 삶을 대신하는 듯도 하다. 바라보기만 해도 제 빛을 나눠주는 달, 그 빛을 받고 있으면 어느 새 내가 밤하늘에 훌쩍 올라앉은 듯하다.
달의 모양은 천체의 법칙에 의해서 라지만 그래도 스스로 모양이 변한다고 생각하는 게 더 그럴 듯하다. 어제에 비해 오늘 좀 더 자란 모습이 그러하다. 인간이 달에 첫발을 내딛었을 때 옥토끼의 계수나무 꿈은 금세 사라질 듯하더니 오늘도 여전한 걸 보면 두고두고 사라지지 않을 우리의 꿈 때문이지 싶다.
초승달은 갓 태어난 아기 모습 같다. 아직 젖내조차 가시지 않은 신생아 말이다. 눈도 뜨지 못해 꼬물거리지만 한 해 동안 자라는 성장이 얼마나 경이로운가. 초승달은 그런 모습이다. 초승달을 바라보고 있으면 눈이 시리다. 밤하늘이 너무 광활하다. 그러나 진작 홀로 서기를 깨달은 것일까, 이미 제 빛을 낼 줄 아는 것을 보면. 토실해져 가는 종아리에서 삶을 살아가는 용기와 지혜를 본다.
상현달은 어른이 되고 싶은 사춘기 아이 모습이다. 경기 침체니 대학 입시니 해서 꿈과 갈등을 함께 겪고 있지만 그래도 빨리빨리 자라고 싶은 아이들의 모습이다. 여백 속에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있다.
보름달은 인생의 정점이다. 꿈과 실천이 함께 어우러진 청년기의 모습이다. 그래서인지 보름달은 꿈과 낭만으로 전설을 만들어 낸다. 그런데 달빛이 햇빛의 반사라면 달은 그저 제 스스로를 밤하늘에 투영시킨 빈 마음인가 보다. 어쩜 밤하늘이 아늑하고 풍요롭게 느껴지는 것도 달이 주는 빈 마음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하필이면 가장 둥근 달인 대보름날에 소원을 비는 것도 달의 마음 비우기 작업을 배우려는 것이리라.
하현달은 훌쩍 중년의 길목에 들어선 내 모습이다. 인생의 한 획을 긋기는 했으나 아직 할 일이 많은 때다. 정신은 풍부하고 맑아야 하지만 여의찮다. 땀 흘려 일한 보람은 함께 나누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듯 제 몫을 줄여 나갈 때다. 삶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너그러움이다. 고통을 나누는 것에도 받아들이는 것에도 겸허해 할 줄 안다. 삶을 사랑하는 여유와 세월 속에 담긴 또 다른 의미를 깨달을 줄도 안다. 눈가의 주름과 희끗희끗한 흰머리가 결코 헛된 세월이 아니었음을 느끼고 싶어한다. 이때쯤은 체념도 배워야 할 때인 듯싶다.
그믐달은 새벽녘에 칼날 같은 빛을 안고 있어 누군가는 미인의 아미라고도 노래했고 과수의 한이라고도 노래하지 않았던가. 삶을 정리하는 노년의 정기가 때론 저렇게 정갈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젊은 날, 우리는 가까운 바닷가에서 대보름 달맞이를 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꿈을 소원하며 함께 달을 바라보는 일은 진작부터 흥분됐다. 우리는 사람들 속에 섞여 들뜬 마음으로 한참을 기다렸다. 때마침 동해 바다의 수평선을 뒤덮은 구름 때문에 달은 기색도 없이 솟았다가 주위가 어둑해지고 나서야 제 모습을 드러냈다. 달의 모습은 참으로 단아했다. 그러나 어느 한 곳 이지러진 구석 없이 휘영청 떠오른 달은 사람들의 소원을 담기 보다 너희들의 하기 나름이라는 냉소를 담고 있는 듯했다. 동해 바다의 두텁고 육중한 물길을 뚫고 홀연히 그 몸체를 드러내야 하는 고통은 아름다움보다 어떤 절절함이 배여 있었다. 절제된 단아함, 그건 마치 상복 입은 여인의 아름다움 같은 것이었다. 안으로 울음을 삼키고 있는 그건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두들 탄성을 자아냈고 저마다 두 손 모아 소원을 빌었다. 가족의 건강을 소원하고 미래의 평안을 소원하는 무게들이 힘겨웠던지 달은 잠시 구름 뒤로 비껴 섰다. 너도나도 소원을 비는 것이 채 끝나지도 않아 마음을 졸였으나 정작 구름을 걷고 나온 달은 의연했다. 사람들의 소원이 밤바다를 메웠지만 달은 교교히 떠 있었다. 그날 밤 내내 달은 그렇게 교만스러웠다.
정월 대보름 달이 교만했듯 내 젊은 날도 그러했다. 우리의 앞날은 행복만이 가득할 줄 알았다. 그러나 오만함 뒤의 빈자리가 얼마나 초라한 것이지 그것을 깨닫는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어쩜 보름달이 그처럼 교교히 빛났던 건 아마도 초라한 뒷모습을 감추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나 싶다.
쉬 끝나리라 여겼던 우리의 젊은 계획은 좀체 결과를 이루지 못했다. 젊음의 만용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삶에 대한 교만함 때문이었는지 결과는 해마다 빗나갔다. 남편은 점점 어깨에 힘을 잃어갔고 나는 나대로 꿈이 바래져 갔다. 그때 나는 달에게 소원을 빌곤 했는데 비껴 가는 소원 때문에 둥근 달이 꼭 심통 사나운 뺑덕 어미의 얼굴처럼 보였다. 무심하니 슬렁슬렁 지나는 한가로운 달을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에서 잊혀지고 있는 듯한 서러움에 그렇게 탓하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구름을 걷고 나온 보름달이 의연했듯 우리도 그런 의연함을 닮고 싶었다. 우린 많은 것을 떠나 보냈지만 여전히 많은 것이 남아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떠난 것을 슬퍼할 게 아니라 새로 태어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기다릴 줄 아는 자연의 너그러움에 비하면 재촉해 달려나가는 건 오직 인간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달은 부드럽고 따뜻하다. 그리고 너그럽고 포근하다. 어쩜 그건 세상의 불 밝기가 되어오는 동안 체득한 삶의 질곡 탓이리라. 그러고 보니 밤하늘의 달이 아름다운 건 이미 내일의 모습을 아는 까닭이 아닐까. 빈자리를 채울 줄도 만들 줄도 아는 달의 모습에서 우리는 저마다의 미래를 보는 성싶다.
죽음이 한 생의 육신을 거두어도 언젠가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아는 것처럼 달의 윤회는 기다림을 가르쳐 주는 삶의 스승이라는 생각이 든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