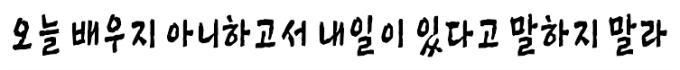칼럼 미룰 '하루'는 없다 - 타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3,883회 작성일 10-09-26 20:33
본문
친구 바바라와 서로 울면서 전화를 끊은 뒤 나는 멍해질 수 밖에 없었다.
설마 설마 했는데 암이라니 그것도 직장암 수술을 받은 지가 얼마전인데 이미 간과 페에 까지 퍼졌다는 것이 아닌가.
암의 마지막 단계.스테이지 4라고 했다.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를 해 줄 수 있나.
바바라를 안 지 십 오년. 비슷한때 결혼해서 우리 둘은 누가 아이 많이 낳나 내기라도 하듯이 교대로 출산, 나는 세명에서 그치고 바브라는 계속 혼자 경주를 하듯 다섯을 낳았다.
참을성과 인내심으로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인 바바라. 분만때 무통 주사를 맞지 않기 위해 밤새 진통하다가 바로 출산 직전에 병원에 갈 정도이다.
그래서 아이 다섯을 모두 병원에 간 지 한 시간안에 낳았는데 막내 딸은 15분만에 낳아 담당의사까지 “이러다간 내가(의사) 아기 받기 전 심장마비 일으키겠다.”고 야단칠 정도다.
그렇게 고통을 잘 참던 그녀가 이상하게 막내를 낳은 후 자꾸 배가 아프다고 호소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화장실을 가면 혹시 모유에 영양가가 없는 것은 아닐까?하며 오히려 아이 걱정을 하던 그녀였다.
전화통화를 하다가, 나는 아이들 다섯을 데리고 땡스기빙 디너를 만들 바브라가 안타까워 우리집으로 초대를 했다. 더군다나 그집 식구들은 미국음식보다 한국음식을 더 좋아한다.
아이들은 우리집에 오면, “앤티, 타냐! 밥하고 김을 주세요.”하고 남편인 에릭은 꼭 김치를 찾을 정도로 한국음식을 좋아한다.
그 날 한식 양식으로 어울어져 풍성한 식탁이 차려지고, 또 항상 땡스기빙이면 모이는 식구들과 더불어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평소이면 이리저리 부엌으로 아이들을 돌보며 왔다갔다 할 바브라가 기운이 없어 보이고 피곤하고 안색이 안되여 보였다.
그러나 아이 다섯에 직장, 집인일 등등 단 일초도 자신을 위해 쓸 수 없는 바바라가 피곤해 보이는 건 당연 하다고 생각했다.
떠나면서 병원에 꼭 가 보겠다고 약속을 한 바브라가 크리스마스 즈음 연락이 왔다.
“직장암이래..암이 이인치 정도 자라 잘라 내야 한다네.. 수술 전에 우리 교회에서 나를 위해 특별 기도회를 갖는 다는데 와 주겠니?” 라고 했을 때
“물론!”하는 대답이 목에 걸렸다.
그런데 며칠 지난 후 수술이 좀 늦어질 것 같다는 전화를 했다.
그녀를 수술하기로 한 담당의사가 자신의 침대에서 시체로 발견 되었다는 것이다. 그말을 들은 나는 “설마”하고 놀랐더니
“나를 고쳐야 할 의사가 죽었다는 거 참 아이러니 하지 않니?”며 의미있게 웃었다. 우리는 한 편의 블랙 코메디 같다며 같이 웃다가 또 울다가 했다.
바브라는 우선 수술 일정이 늦추어 지니 가족이 계획한 대로 겨울휴가를 갔다 오겠다고 했다.
휴가동안에 통화한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하고 밝아서 모든일이 잘 될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 기도하기로 한 날, 바브라의 교회에서 우리는 오랫만에 옛 친구들을 만났다.
자주 만나자 하면서 우리는 결혼식이나 아이들 생일이나 장례식에서나 만났다.
함께 학교를 다니고 오랫동안 함께 교회를 다닌 친구들이라 오랫만에 만나도 스스럼이 없이 마냥 좋기만 하다.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게임 나잇을 만들자구.”
“그래! 그러자구..”
그리고 우리는 웃었다.
작년 친구의 결혼식에 만나서도 똑같은 대화를 했기 때문이다.
정말 무엇에 이렇게 바쁜 것일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께 보내는 느긋한 시간 보다도 더 귀한 건 무엇일까?
그 순간 문득, 얼마전에 읽은 미치 앨범의 “단 하루만 더”라는 책이 생각났다.
저자는 우리에게 지난 뒤 후회하지 말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충분히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메세지를 전했다.
어제 밤새 뒤척이며 바브라를 생각해 봤다.
뜬 눈으로 자는 다섯 아이들을 보고 있을 것만 같아 마음이 뭉클해졌다.
내가 그녀를 위해 지금 해 줄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아침에 되어 바바라에게 전화를 했다.
“너 보러 갈려구..”
평소 같으면 바쁜데 오지말라고 말릴 바브라가 말한다.
“그래. 빨리 와.” 살면서 미룰 하루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하루’는 의미를 부여할 때 충분히 긴 시간이기 때문이다.
설마 설마 했는데 암이라니 그것도 직장암 수술을 받은 지가 얼마전인데 이미 간과 페에 까지 퍼졌다는 것이 아닌가.
암의 마지막 단계.스테이지 4라고 했다.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를 해 줄 수 있나.
바바라를 안 지 십 오년. 비슷한때 결혼해서 우리 둘은 누가 아이 많이 낳나 내기라도 하듯이 교대로 출산, 나는 세명에서 그치고 바브라는 계속 혼자 경주를 하듯 다섯을 낳았다.
참을성과 인내심으로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인 바바라. 분만때 무통 주사를 맞지 않기 위해 밤새 진통하다가 바로 출산 직전에 병원에 갈 정도이다.
그래서 아이 다섯을 모두 병원에 간 지 한 시간안에 낳았는데 막내 딸은 15분만에 낳아 담당의사까지 “이러다간 내가(의사) 아기 받기 전 심장마비 일으키겠다.”고 야단칠 정도다.
그렇게 고통을 잘 참던 그녀가 이상하게 막내를 낳은 후 자꾸 배가 아프다고 호소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화장실을 가면 혹시 모유에 영양가가 없는 것은 아닐까?하며 오히려 아이 걱정을 하던 그녀였다.
전화통화를 하다가, 나는 아이들 다섯을 데리고 땡스기빙 디너를 만들 바브라가 안타까워 우리집으로 초대를 했다. 더군다나 그집 식구들은 미국음식보다 한국음식을 더 좋아한다.
아이들은 우리집에 오면, “앤티, 타냐! 밥하고 김을 주세요.”하고 남편인 에릭은 꼭 김치를 찾을 정도로 한국음식을 좋아한다.
그 날 한식 양식으로 어울어져 풍성한 식탁이 차려지고, 또 항상 땡스기빙이면 모이는 식구들과 더불어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평소이면 이리저리 부엌으로 아이들을 돌보며 왔다갔다 할 바브라가 기운이 없어 보이고 피곤하고 안색이 안되여 보였다.
그러나 아이 다섯에 직장, 집인일 등등 단 일초도 자신을 위해 쓸 수 없는 바바라가 피곤해 보이는 건 당연 하다고 생각했다.
떠나면서 병원에 꼭 가 보겠다고 약속을 한 바브라가 크리스마스 즈음 연락이 왔다.
“직장암이래..암이 이인치 정도 자라 잘라 내야 한다네.. 수술 전에 우리 교회에서 나를 위해 특별 기도회를 갖는 다는데 와 주겠니?” 라고 했을 때
“물론!”하는 대답이 목에 걸렸다.
그런데 며칠 지난 후 수술이 좀 늦어질 것 같다는 전화를 했다.
그녀를 수술하기로 한 담당의사가 자신의 침대에서 시체로 발견 되었다는 것이다. 그말을 들은 나는 “설마”하고 놀랐더니
“나를 고쳐야 할 의사가 죽었다는 거 참 아이러니 하지 않니?”며 의미있게 웃었다. 우리는 한 편의 블랙 코메디 같다며 같이 웃다가 또 울다가 했다.
바브라는 우선 수술 일정이 늦추어 지니 가족이 계획한 대로 겨울휴가를 갔다 오겠다고 했다.
휴가동안에 통화한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하고 밝아서 모든일이 잘 될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 기도하기로 한 날, 바브라의 교회에서 우리는 오랫만에 옛 친구들을 만났다.
자주 만나자 하면서 우리는 결혼식이나 아이들 생일이나 장례식에서나 만났다.
함께 학교를 다니고 오랫동안 함께 교회를 다닌 친구들이라 오랫만에 만나도 스스럼이 없이 마냥 좋기만 하다.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게임 나잇을 만들자구.”
“그래! 그러자구..”
그리고 우리는 웃었다.
작년 친구의 결혼식에 만나서도 똑같은 대화를 했기 때문이다.
정말 무엇에 이렇게 바쁜 것일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께 보내는 느긋한 시간 보다도 더 귀한 건 무엇일까?
그 순간 문득, 얼마전에 읽은 미치 앨범의 “단 하루만 더”라는 책이 생각났다.
저자는 우리에게 지난 뒤 후회하지 말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충분히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메세지를 전했다.
어제 밤새 뒤척이며 바브라를 생각해 봤다.
뜬 눈으로 자는 다섯 아이들을 보고 있을 것만 같아 마음이 뭉클해졌다.
내가 그녀를 위해 지금 해 줄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아침에 되어 바바라에게 전화를 했다.
“너 보러 갈려구..”
평소 같으면 바쁜데 오지말라고 말릴 바브라가 말한다.
“그래. 빨리 와.” 살면서 미룰 하루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하루’는 의미를 부여할 때 충분히 긴 시간이기 때문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