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간 80% 망가져도 `정상수치` 라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720회 작성일 15-06-19 01:45
본문
직장인은 대부분 11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종합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일부 직장은 이미 종합건강검진 안내문을 배포하고 건진항목을 잘 골라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있다.직원의 건강은 기업경쟁력과 직결된다.
직원과 배우자가 건강해야 생산성이 올라가고 이는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진다. 회사 내 아픈 사람이 없으면 결근이 없다.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직장동료가 많으면 회사 분위기는 침울하고 사기가 떨어진다.이 때문에 직장 건강검진은 의미가 작지 않다. 직장인은 회사가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책무가 있다. 건강검진 이후 병원이 제공하는 검진표도 책상서랍에 구겨넣지 말고 가능하면 병원을 찾아가서 담당의사의 주의사항을 듣고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현재 질환이 없다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는 "건강검진표에는 미래에 앓게 될 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 여러 숫자들이 적혀 있다"며 "숫자가 의미하는 정확한 내용을 모두 알 필요는 없지만 고혈압, 당뇨, 비만, 콜레스테롤 등과 같은 일반적인 항목을 기억해두면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매우 유익하다"고 조언한다.
검진표를 받으면 '정상'이라고 진단받은 항목이 많다. 하지만 정상수치라고 해서 질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상은 의학적으로 건강한 사람(큰 질환 없고 술ㆍ담배를 거의 하지 않은 정상인)의 측정치로부터 가장 높은 쪽과 가장 낮은 쪽의 2.5%를 제외한 95%를 말하는 것으로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간이 80% 망가질 때까지도 간 수치는 정상으로 나온다. 거의 매일 술을 먹어 간이 50%가 망가져도 수치는 정상으로 나온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 '정상수치'를 '참고치'라고도 적는다. 정상범위라도 개인 차가 크고 정상수치라도 질환이 있는 사람이 있거나 이상수치라도 질환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어 참고치라고 바꿔 부르고 있다. 따라서 수치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공복 시 혈당이 똑같은 115㎎/㎗라도 의미가 다를 수 있다. 한 사람은 수치 변화가 85→98→115㎎/㎗로 검사 때마다 올라가고 또 다른 사람은 141→129→115㎎/㎗로 내려간다면 수치의 의미는 큰 차이가 있다. 총콜레스테롤이 지난번 검사와 이번 검사에서 똑같이 225㎎/㎗인 사람이 있다. HDL(고밀도 지단백)콜레스테롤이 지난번 80㎎/㎗에서 이번에는 45㎎/㎗였다. 중성지방은 두 번 다 100㎎/㎗였다. 이럴 경우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는 LDL(저밀도 지단백)콜레스테롤은 지난번 검사 때 125㎎/㎗에서 이번에는 160㎎/㎗으로 증가했다는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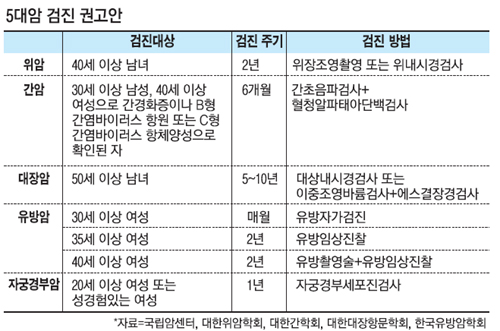
간기능 수치도 ALT(SGPT)가 40u/ℓ까지 정상으로 보고 있지만 15u/ℓ 나온 사람과 35u/ℓ 나온 사람 모두 정상치(참고치)에 있지만 다르다. 수능시험에서 1등급이지만 1등과 3등급의 차이와 같다.
검진표를 봤을 때 정상이지만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식사량이나 질, 운동량, 수면시간, 음주습관, 스트레스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일주일에 나흘 이상은 음주하지 말고 외식이 많다면 가급적 저칼로리로 영양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기본검사로 가장 중요한 검사가 혈압측정이다. 혈압은 뇌졸중, 심장병 예방 및 조기 발견에 매우 중요하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에 부담을 주고 동맥경화가 진행돼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신장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혈압은 심장이 수축할 때 쟀을 경우 120㎜Hg, 이완됐을 경우 80㎜Hg가 정상이다. 140/90㎜Hg는 고혈압 전단계, 159/99㎜Hg는 1기 고혈압, 그 이상은 2기 고혈압이라고 부른다.
옛날에는 130/90㎜Hg가 정상이었지만 혈압이 높을수록 뇌졸중, 심장병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더 잘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평균 수명이 늘면서 그 영향이 커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혈압의 정상수치가 낮아졌다. 혈압은 혈액이 흐르면서 동맥혈관벽에 가하는 힘의 양을 의미한다. 혈압은 집에서 잰 것과 병원에서 잰 것이 다를 정도로 일정하지 않다.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여름과 겨울의 혈압 차이도 5~10㎜Hg에 달한다. 고혈압은 운동이나 식사 등 생활습관을 바꾸거나 약물복용만으로 치료할 수 있다.
체지방분석과 비만검사로 생활습관병 및 성인병의 발병 가능성을 알 수 있다. 비만의 판정기준은 체질량지수(BMI)로 키와 몸무게를 이용해 지방의 양을 추정한다. BMI지수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눠 산출한다. 예를 들어 키가 170㎝, 몸무게가 75㎏이면 BMI지수는 75÷(1.7)●= 25.9이다. BMI지수가 20~24kg/㎡를 정상 체중, 20 미만일 때를 저체중, 25~30일 때는 과체중, 30 이상일 경우 고도비만이라고 한다. 30~35는 중등도 위험, 35~40은 심한 위험, 40 이상은 극심한 위험을 의미한다. 체지방으로 비만을 측정하기도 한다. 남성은 몸무게에 대한 지방비율인 체지방률이 25%를 넘으면 비만이라고 본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몸의 지방량이 많은 편이어서 30%를 넘어야 비만이라고 진단한다. 비만은 머리 끝에서 발 끝까지 모든 질환을 초래한다.
혈당은 당뇨병 진단에 반드시 필요한 검사다. 혈당은 8시간 금식한 후에 측정했을 때 100㎎/㎗ 미만이면 정상이다. 100~125 사이는 당뇨병 전단계, 126이 넘으면 당뇨병으로 진단한다. 당뇨병은 5~1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높아져 질환으로 발전하는 만큼 일찍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는 병원에서 피를 뽑아 잰 수치를 말한다. 집에서 손가락 끝을 따서 재는 혈당계로는 80 전후가 된다. 혈당계 수치는 혈당보다 낮게 나오기 때문에 그 수치에 20을 더해야 한다. ※참조=닥터 건강검진(양형규 지음ㆍYMB 출간)
매일경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