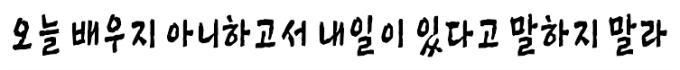기행문 산티아고 순례길 낙수 ( 제 12 신 ) - 나의 명상과 성찰을 위한 시간, 관광이 아니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Angel 댓글 0건 조회 1,337회 작성일 14-10-06 10:37
본문
얼었던 땅이 질척인다.. 봄이 곱기만 한것은 아니구나. 나목과 대지가 헐벗음이 부끄러운가 연일 짙은 연무에 쌓여있다. 철이른 꽃들 - 알몬드, 배, 살구꽃등 - 의 뽐내려는 하얀 자태를 방해한다. 그림보다 아름다울 봄 풍경을 좌우에 두고도 제대로 볼 수 없다니! 물집잡힌 발로 가는 불편도 한결 덜 할텐데.. .
천년을 넘는 세월동안 카스피해로부터 발탁해 연안에 이르기까지, 또 온 유럽의 이 왕국 저 교회 등이 자기 고장에서 출발한 순례자들을 돌보려, 교세를 확장하려, 경쟁적으로 순례길 요소에 건립한 성당과 숙소와 병원 등이 산티아고가 가까워질수록 잦게 눈에 띈다. 폐허가 된 곳들은 아마도 이들을 지원하고 유지하던 군주나 교회가 몰락했으리라. 흥망과 영고성쇠의 세월이 애닲다. ( 지난 날 부여 낙화암에서 백마강을 내려다보며 비슷한 감회를 느꼈지 ).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처처에 세워진 병원들 - 시대를 달리하여, 기독교권 전역에서 설립하고 후원한 병원들이다. 그만큼 끝없이 구도자의 행렬이 있어왔다는 징표며, 또 언어와 생활방식이 생소한 수행자들의 고통을 헤아린 연민 때문이었으리라.
초기 유일신앙을 확립하면서, 그 후성지를 탈환 유지하는 동안 그토록 살육을 저지른 기독신앙속에 이처럼 자애로운 면이 있었음이 참으로 난해하구나. 특히 내 가슴을 찡하게 만든 것은 중세에 세워진 나병원들이다.
우리는 보듬어주기는 커녕, 천형 또는 천벌로 지목하며 기피하고 배타해버린 외롭고 가여운 나병환자들! 언제 이들을 수용하고 치료를 베푼 때가 있었던가? 개화가 앞섰던 일본의 강점후에야 비로소 일부 수용시설을 열었지. 우리의 방랑시인 - 마을에서 쫓겨난 탓에 – '한하운'의『보리피리』를 아는가?
보리피리 불며 봄 언덕 / 고향 그리워 / 필 - ㄹ 닐니리
보리피리 불며 꽃 청산 / 어릴때 그리워 / 필 - ㄹ 닐니리
보리피리 불며 인환의 거리 / 인간사 그리워 / 필 - ㄹ 닐니리
보리피리 불며 방랑의 기산하 / 눈물의 언덕을 지나 / 필 - ㄹ 닐니리
이 길 종착지 산티아고로 오르는 언덕배기 양지쪽에는 ‘산 라사로 산티아고’( San Lazaro Santiago) 라는 12세기에 세운 나병원과 예배당이 있다 ( 마지막회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 나는 이 병원 앞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한동안 서 있었다오. 무어라 말을 잇지 못하고.. .
불편한 발을 절며 점심들을 먹고 있는 풀밭에 뒤늦게 합류하니 이미 식사를 끝낸 동행자들이 따사로운 햇빛을 받으며 피로를 풀고있다. 참 편한 서구의 젊은이들, 사내들은 아예 상체를 벗고 일광욕이다. 여자들 몇몇도 흰 피부와 금발을 흐뜨리고 브래지어만 감싼채 엎드려서 볕을 쐰다.
빵 씹는 맛보다 눈요기가 더 좋구나.
양말을 벗고 발바닥을 내려다보며 난감해 하는데 옆에 누워있던 털북숭이가 “Do you mind I'd be of some help?” 하면서 상체를 일으킨다. 뭔가 좋은 약을 가졌나 싶어 “Not at all” 하며 고마운 낯빛을 보이니, 이 친구 어느새 바늘을 라이터 불에 쐬이고는 실을 길게 낀다. 왼발 물집이 한 덩이로 떡이 되어 어느 순간 터질 기세다. 나에게 고개를 돌려 꽃나무를 보라하며 바늘을 열십자로 두 차례 넣었다 천천히 당겨 물을 뽑은 후 칼로 몇 군데 피부를 가르고 연고를 넣으려기에, 내 연고를 사용하라고 건네니 자기 약을 써야 치료비를 받지 않겠는가고 농을 던진다.
이것이 순례자의 자비로움이다. 이 은혜, 언제 어떻게 갚나 생각하며 이름과 국적을 물었더니 그저 Scotland 에서 온 Ben - Benjamin의 애칭 - 이라며 자기일행과 떠나려하네. 물론 고맙다는 말은 했지만 저녁에 와인이라도 한 병 대접하리라 마음먹고, 걸어가는 등 뒤에다 감사의 눈길을 던졌지.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람을 다시는 만날 수 없었네. 걷는 구간이 다른 까닭이었나 싶군. Ben, well Camino! 고맙네! 그리고 앞날에 많은 행운이 있기를!)
통증이 좀 가시니 발에 속도가 붙는다. 안개도 많이 가신 오후의 봄빛이 너무도 화사롭다. 타향의 꽃길을 홀로 가니 외로움이 깃든 공허한 황홀감이다. 들뜬 기분을 잡아 내리는 것은 돌길에 엉겨붙은 쇠똥과 진동하는 냄새다. 이 지방이 중산간 지역이어서 밭농사 짓기에는 경사가 가파른 편이라, 양쪽 산록이 푸르른 목초로 싱그럽다. 겨울에는 집집마다 보온을 한 우리안에 갇혀있다가 날씨가 풀려 각자의 초지로 몰이하는 동안, 소들도 새봄 새바람 새풀 생각에 방자해졌는가, 함부로 쏟아내는구나. 이후로 사 나흘을 스페인 쇠똥냄새에 코가 절을 줄이야!
그래, 이 길이 나의 명상과 성찰을 위한 시간이지, 관광이 아니지! 지금 나는 이토록 좋은 신발을 신고 가지만, 그 옛날 구도자들은 옆이 터진 샌들로 오물을 밟으며 걸었겠지.. . 오늘 날 이 좋은 시절이 오도록 기도하며 걸어갔을까? 무슨 생각을 하며 갔을까?
- 이전글산티아고 순례길 낙수 ( 제 13 신 ) - 나만 속세적 마음에서 허우적 거렸구나 14.10.06
- 다음글산티아고 순례길 낙수 ( 제 11 신 ) - 아..! 봄이 여기 숨어 있었구나 14.10.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