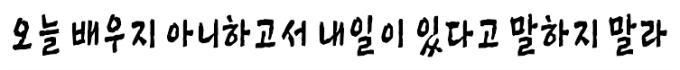수필 잔디보다 잡초 - 노 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VORY 댓글 0건 조회 3,830회 작성일 11-08-13 09:40
본문
법정 스님 돌아가신 소식에 책꽂이에서 누렇게 바랜 ‘물소리 바람소리’를 다시 꺼내 봤듯이 박완서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분의 산문집 한 권을 얻어들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읽을 때는 내 엄마의 6.25이야기를 듣는 만큼이나 빠져들었건만 그 뿐. 팽팽도는 이민 생활에 한국어로 된 글을 찾아 볼 사치조차도 잘 누리지 못했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당에 나갔다가 열시 넘는 시간에 들어온다고 시작한 글에서 그 분은 잔디에 난 잡초를 뽑는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 왠지 소박할 것만 같은 박완서 씨의 모습과 잔디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았다. 조용남의 ‘고향의 푸른 잔디여……’는 팝송이 사랑 받던 시절, 미국적인 분위기와 가수의 남다른 가창력이 합해져 유행을 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의 고향, 한국과 잔디는 아무래도 좀 어색하다.
손 바닥 만 하다는 말이 잘 어울리는 우리 집 마당도 잔디로 되어있지만, 나는 잔디밭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천편 일률적으로 아무런 개성도 없는 잔디밭이 맘에 들지가 않는 것이다. 온 정성을 다 들여 깔끔히 손질되어 반반히 윤이나는 잔디밭이라도 초록색 비닐 카펫처럼 정이 안간다.
우리 잔디밭은 겨우 이웃의 눈총을 피할 정도로 남편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 초여름 민들레가 우거질 무렵이면 남편은 분초를 다투는 출근 시간에도 후닥닥 민들레를 뽑곤한다. 그럴 때마다 내가 “꽃이 이쁜데 그냥 좀 놔두지.”해도 내 말을 듣는 적이 없다.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으니 어떨 땐 느닷없이 잡초 죽이는 약을 뿌려댄다. 이름 모를 풀에 미안한듯 숨어 피는 자잘한 꽃들을 유난히 좋아하는 나는 잔디에 핀 샛노란 민들레나 연보라 꽃을 피우는 클로버를 절대로 잡초라고 부르지 않는다. 한번은 잔디에 난 풀을 드려다보다가 놀란 적이 있다. 잔디 깍는 기계가 지나간 그 밑에는 팥알보다 더 작은 열매가 빨간 구슬알처럼 총총히 달린 산딸기 종류의 잡초가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난히도 두껍게 얼어붙었던 눈더미 아래 석달 넘게 눌려있다가 서서히 드러난 우리집 초라한 잔디밭을 내다보며 궁리를 하고 있던 터라 박완서 씨의 잔디 이야기가 새삼스러웠나 보다.
앞 마당은 감히 건드릴 수 없다쳐도 내가 지금 내다보며 궁리를 하는 곳은 손바닥의 반쪽 만한 뒷 마당이다. 한 쪽 구석에 매년 어김없이 돋아나는 부추와 깻잎이 있는 밭이 있지만, 담장에 아이비가 무성하고 큰 나무가 몇 구루 있어 다소는 우중충한 구석이 있는 곳이다.
엄마는 내 어린시절 그렇게 여러번 이사를 다니면서도 항상 꽃밭을 만드셨었다. 채송화와 나팔꽃과 봉선화와 분꽃과 꽈리꽃, 국화와 코스모스와 해바라기, 쑤세미 덩쿨과 유자 덩쿨과 또는 깻잎나무나 컴푸리라는 약초 그리고 할미꽃까지도 아무런 규칙도 이론도 없이 이름 모를 잡초들과 어울려 흐드러지는 마당이었다.
나도 한번 그런 마당을 만들어볼까? 그럴려면 남편과 싸워야한다. 지난 해 가느다란 감나무 하나를 뒷 마당에 심으며 남편이랑 싱겡이를 벌인 이유는, 나는 나무가 커가면서 실컷 뻗어 나도록 잔디밭 가운데에 심자고 했고 남편은 잔디밭을 건드리지 않도록 벽에 붙여 심으려 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 잔디보다 잡초다. 남편을 이겨내고 저 잔디밭을 과감히 없애버리자 .
박완서씨 글에는, 어디서 날라왔는지 하룻밤 새에 잡풀이 자라 꽃까지 피우는 생명력이 경이롭기하면서도 끝없는 자신의 노동력에 맥이 빠지면서 ‘내가 졌다’라며 백기를 든다,라고 쓰여있다. 그러자. 아예 뒷 마당 잔디밭에 잡풀과 잡초가 마음껏 자라도록 내버려두자. 어떤 모양으로 자라 어떤 꽃을 피우는지 두고 보다가 사이사이로 자갈 오솔길도 만들고 온갖 꽃 나무들을 여기저기 풍성하게 심어보자. 큰 돌맹이도 군데군데 놓아 마당이 온통 울퉁불퉁하니 보기에도 편안한 꽃 밭이 되도록.
타향 생활 30년만에 드디어 내 어린시절 정취로의 회기인가.
이 넓은 지구 상에 내 것으로 지정되어 있는 작디 작은 땅뙈기를 이제는 내 맘대로 내 식으로 한껏 가꾸어 보라는 도전의 봄 바람이 겨울내 꽁꽁 얼었던 마음을 부추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